‘美가 뒤통수 때렸다’는 동맹국들의 현타[오늘과 내일/이정은]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北 위협으로 더 복잡한 韓 경제안보 함수
美 ‘반도체 특사’라도 고용해 동맹 챙겨야

“링컨 대통령은 1860년대 농업 투자로 식량안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940년대에는 루스벨트와 트루먼 대통령이 핵 안보에 투자했고….”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의미를 추켜세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최근 조지타운대 연설은 거창했다. 역사적 지도자들의 업적을 하나씩 소환하며 반도체법을 동급으로 끌어올렸다. 그에 따르면 반도체법은 케네디 대통령의 인류 최초 달 탐사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미국의 미래를 바꿀 업적이다.
반도체 제조업 부활을 통해 ‘신규 기술자 10만 명 양성’, ‘여성 100만 명 고용’ 같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자는 구체적 주문들이 워싱턴에서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사내 어린이집도 지어야 한다. 그냥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육 전문가,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협의해 양질의 운영 프로그램을 짜라는 식이다. “미국이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복지 부담을 반도체법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려 든다”는 말까지 나온다.
미국 정책의 초점이 국내 이슈에 맞춰지면서 외교는 어느 순간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안보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반도체 동맹’으로 뭉치자”던 당국자들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화끈하게 쏠 것 같았던 반도체법은 세부 내용을 까면 깔수록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불리한 내용이 속출하고 있다. 상무부와 국무부, 백악관이 각자 딴소리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이미 한 차례 등에 칼이 꽂힌 한국 기업들은 뒤통수까지 얼얼할 지경이다.
국익 앞에서는 동맹도 친구도 없다는 명제는 새삼스럽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동맹인 일본을 주저앉힌 게 미국이다. 이번에는 중국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맞는 유탄의 충격이 간단치 않다.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칩4’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나올 논의 내용도 불안하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는 대외 경제통상 정책이 군사안보와 겹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때로 경제 이익까지 희생해야 하는 계산법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미국을 상대로 한 경제안보 함수가 더 복잡하다는 말이다. 더구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생큐”를 연발한 미국에 수십조 원대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마땅한 대안도 없는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보겠다며 줄줄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덜레스 공항 문턱이 닳아 없어질 판이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살길임을 절감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는 나라가 어디 한국뿐이겠는가. 일본과 네덜란드, 대만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볼멘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동맹의 환상’을 깨뜨린 지독한 ‘현타’가 각자도생을 위한 플랜 B로 옮겨가지 말란 법 없다. 미국은 일각에서 제안이 나온 대로 우호국들과 정책을 조율할 ‘반도체 특사’라도 지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 대외적으로 안보, 국내에서는 경제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은 미국에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2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
6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7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8
정동극장 이사장 ‘李지지’ 배우 장동직
-
9
30년 이상 고정 주담대 나온다는데…내 대출, 뭐가 달라질까?
-
10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4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5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6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7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8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10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2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
6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7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8
정동극장 이사장 ‘李지지’ 배우 장동직
-
9
30년 이상 고정 주담대 나온다는데…내 대출, 뭐가 달라질까?
-
10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4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5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6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7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8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10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합리적 관련성’ 없는 별건 수사 말라는 법원의 경고 [오늘과 내일/장택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0/13339268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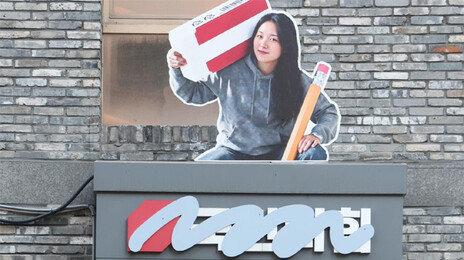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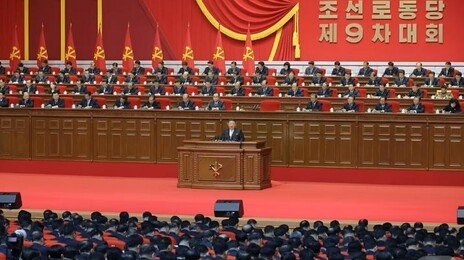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