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뉴스룸/민병선]디지털 디스토피아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1. “아빠 어서 오세요.”
“어 그래, 우리 애기 잘 놀았어.”
“아빠, 근데 스마트폰은?”
집과 대중교통에서 마주치는 흔한 풍경이다. 요즘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말한다. 아이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적은 스마트폰이라고.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163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관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체 학생의 17.9%인 24만여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아이들 교육과 안온한 가정을 망치고 있다. 스마트폰의 문제는 아무데서나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되면 마음대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이 문제의 핵심이다.
한동안 여러 대학 학생들의 대자보 게재가 화제가 됐다. 대학생들은 주로 현 시국에 대한 우려를 대자보에 담고 있지만, 기자는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이용하는 이유에 눈길이 간다. 1980, 90년대 대학생들이 이용하던 구식 표현 수단이 인터넷 세대들을 매료시킨 이유는 뭘까? 그건 대학생들의 인터넷에 대한 불신 때문은 아닐까 싶다.
스마트폰의 폐해와 대자보 사건을 보며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떠올려본다. 본디 디지털과 인터넷은 편리하고 빠르고 유익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가벼운 정보(누구에게는 유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만을 찾는다. 인터넷은 정보를 해석하고 사고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통찰까지 주지는 못한다. 이런 점을 보완하려면 책을 읽어야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인의 1인당 독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유엔 191개 회원국 중 166위다. 한국 성인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채 1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6권이 넘는다. 이 나라들은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독서 강국이기도 하다.
정부는 최근 2018년까지 매년 공공도서관 50개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도 2.2권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하드웨어만 늘린다고 책을 읽는 문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극복할 대대적인 독서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트렌드뉴스
-
1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2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3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4
中 “美의 이란 공습 즉각 중단해야…이란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
5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6
상호관세 막히자 ‘301조’ 꺼낸 트럼프…‘쿠팡 사태’ 3월 7일 조사 분수령
-
7
지지율 하락을 전쟁으로 만회?…트럼프 ‘이란 공격’ 진짜 이유는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10
공습 시작에 테헤란 직장인들, 울며 자녀 학교로 뛰어가…검은 토요일
-
1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2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3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4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9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10
“李대통령 집 내놨다…장동혁 대표는 약속 지켜라” 與, 국힘 압박
트렌드뉴스
-
1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2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3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4
中 “美의 이란 공습 즉각 중단해야…이란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
5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6
상호관세 막히자 ‘301조’ 꺼낸 트럼프…‘쿠팡 사태’ 3월 7일 조사 분수령
-
7
지지율 하락을 전쟁으로 만회?…트럼프 ‘이란 공격’ 진짜 이유는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10
공습 시작에 테헤란 직장인들, 울며 자녀 학교로 뛰어가…검은 토요일
-
1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2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3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4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9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10
“李대통령 집 내놨다…장동혁 대표는 약속 지켜라” 與, 국힘 압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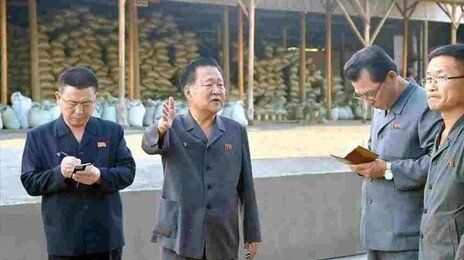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