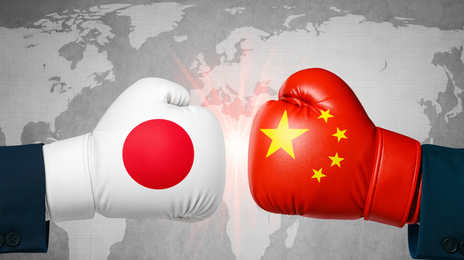공유하기
[기자의 눈/이종식]서민 피 말리는 늑장재판 언제까지
-
입력 2008년 10월 13일 02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이후 20여 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노동쟁의조정법은 1997년 3월 노동조합법으로 통합됐고, 1심 재판부는 5년여 만인 2001년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항소했지만 이듬해인 2002년에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재판은 또 차일피일 미뤄졌다.
벌금 15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춰진 2심 선고도 5년 뒤인 2006년 1월에야 내려졌다.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 넘어가 있지만 기소 햇수로 14년째인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 사건이 특이한 사례라고 치부하더라도 법원의 고질병인 재판 지연은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더욱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게 아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재판을 질질 끌어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기를 기다리면 그만이다. 반면에 서민들에겐 ‘송사 3년에 집안이 거덜 난다’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민사소송이 지연돼도 파산하는 서민이 속출한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사소송 1심 소송의 경우 수도권 법원을 기준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법정기간(접수 뒤 5개월 이내)을 넘긴 사건이 5건 중 한 건꼴이다.
헌법재판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해 8월 말 현재 법정기간(접수 뒤 180일 이내)을 넘긴 심판사건의 비율은 전체의 64%에 이른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재판 지연문제는 단골메뉴처럼 지적된다. 이에 대해 법원과 헌재는 “법정기간은 훈시규정일 뿐이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앵무새 답변’만 되풀이한다. 간이심리제도 도입 같은 매년 거론되는 제도 개선 문제는 그때뿐이다.
지난해 판사 1명이 하루 평균 2.3건의 판결을 내릴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처럼,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시간 끌기 재판이나 서민의 피를 말리는 늑장 재판은 결론이 어떻든 그 과정 자체가 불의(不義)가 될 수도 있다.
이종식 사회부 bell@donga.com
빛나는 조연 >
-

3차보다 강한 2차병원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2
이정후 美공항서 일시 구금…前하원의장까지 나서 풀려났다
-
3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4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5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
6
李대통령 지지율 59%…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47%
-
7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8
與 합당 제안에…조국 “국민 뜻대로” 당내 논의 착수
-
9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10
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5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6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7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8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9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10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2
이정후 美공항서 일시 구금…前하원의장까지 나서 풀려났다
-
3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4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5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
6
李대통령 지지율 59%…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47%
-
7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8
與 합당 제안에…조국 “국민 뜻대로” 당내 논의 착수
-
9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10
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5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6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7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8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9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10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빛나는 조연]英배우 주드 로/주연 압도하는 '2色 카리스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