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위에 앉아 알맞추 불어온 바람에 땀을 씻으며 새삼 우리 사전의 ‘속 좁음’을 느낀다. 입말로 자리 잡았는데도 사전에 오르지 못한 낱말이 떠올라서다. 마당바위와 비슷한 것으로 ‘넓적바위’와 ‘넙적바위’가 있다. 그런데 두 단어는 표준어가 아니다. ‘펀펀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는 뜻의 ‘넓적하다’를 보더라도 표준어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넓적바위는 아예 사전에 올라 있지 않고, 넙적바위는 북한의 문화어란다. 표준어는 ‘너럭바위’다. 예부터 써 왔고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두 낱말을 비표준어로 묶어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언중이 잘못 쓰는 등산 용어가 있다. 야영 장비 없이 산에서 한뎃잠을 자는 것을 일컫는 ‘비박’이 그것이다. 많은 이들은 ‘객지에서 묵는 밤의 횟수를 세는 단위’인 ‘박(泊)’을 떠올려 ‘비박(非泊)’이라고 지레짐작한다. 허나, 비박(非泊)이라는 한자어는 애초에 없다. 바른 표기는 야영을 뜻하는 독일어 ‘비바크(Biwak)’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비박’을 즐겨 쓴다. 발음하기 쉬운 데다 ‘박(泊)’의 이미지를 떠올려서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국립공원에서의 비바크(biwak·일명 ‘비박’)는 불법입니다”라고 두 말을 병기하기에 이르렀다. ‘비박’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서일 것이다.
손진호 어문기자 songbak@donga.com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지현의 정치언락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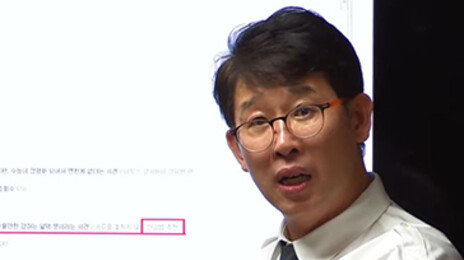
‘1세대 수학 일타강사’ 삽자루 우영철 사망…향년 59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셀프건강진단]냉장고에 있는 물을 바로 마시기가 두렵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852618.1.thumb.jpg)
-

“부추장떡 3000원·국수 4000원”…백종원 손대자 ‘춘향제’ 바가지 사라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대포통장](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5/05/07/71105320.1.jpg)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넓적바위, 비바크, 오름](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5/04/30/70994819.2.jpg)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출사표를 던진다고?](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5/04/23/7086165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