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인이자 연출가인 이윤택씨의 시 ‘막연한 기대와 몽상에 대한 반역·2’의 앞부분이다. 친구인 하재봉 시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다. 시간에 쫓기는 도시 직장인의 비애와 더불어 시가 발표된 1989년 당시 만원 지하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 시처럼 서울이라는 ‘빌딩숲 눈물골짜기’를 다룬 문학작품을 통해 서울을 재조명해 본 비평서들이 서울토박이 국문학 교수에 의해 출간됐다.
권오만(權五滿·66·사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국문학)가 최근 동시에 펴낸 ‘서울의 시, 서울의 시인들―일제강점기편’(도서출판 혜안)과 ‘서울을 시로 읽는다’(〃) 등 2권은 서울이라는 공간적 프리즘을 통해 우리 문학을 더듬어 본 예사롭지 않은 노력의 산물들이다.
앞의 책은 일제강점기에 서울을 노래한 시 31편과 해설을 엮은 해설서이고, ‘서울을 시로…’는 시뿐 아니라 소설 작품에까지 논의를 넓혀 ‘서울의 문학 100년’을 조망한 논문집이다.
두 책은 우리 시를 서울의 공간과 역사 속에서 살피고, 거꾸로 시를 통해 서울 사람들의 삶을 쫓기도 한다.
아무리 각박하고 복잡하다 해도,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준 서울의 거리들에 대해 시인들은 각별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다. 특히 종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광규와 마종기는 각각 통인동과 명륜동을 곧잘 자기 시의 소재로 삼았다.
물론 거대도시 서울에 대한 감정이 풀내음 가득한 시골 마을에 대한 애틋함과 같을 수는 없을 듯. 어떤 이는 ‘가로수가 시멘트에 질식사한 흙의 상주처럼/새끼줄로 복대하고 머리 풀어헤친 오, 서울’(함민복, ‘백신의 도시, 백신의 서울’)이라고 읊었다. 서울을 감옥이나 아귀지옥, 토끼장으로 그린 시들도 있다.
굴곡 많은 역사의 현장이었기에 비탄과 분노, 결의로 얼룩진 시들도 많다.
‘오늘도 세종로가 무사하구나/ 캐터필러 소리가 굉굉굉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두더지였고 파고들어 숨어야 했다.’(고은, ‘광화문에서’ 중)
하지만 권 교수는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시들이 결국 서울을 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은 여전히 대다수 한국인에게 진출해야 할 곳, 소속돼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을 쓴 김혜순 같은 이들의 시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서울은 하나의 경전이자 미로입니다. 알기 어렵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삶 자체를 뜻하는 거지요.”
서울에서 태어나 죽 살아온 권 교수는 ‘서울의 시…’ 서문에서 ‘이 책의 기획은 내가 살아온 인연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경전이자 미로이며,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보물단지인 이 거대도시에서의 삶을 고마운 인연으로 여기는 이가 권 교수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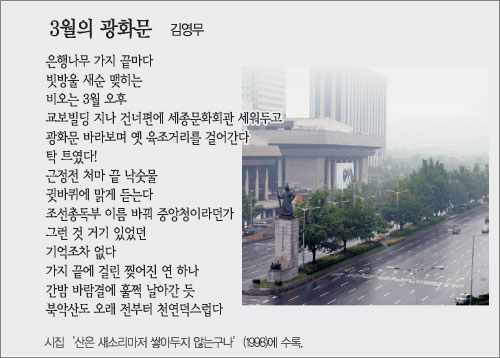 |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메트로 라이프
구독-

밑줄 긋기
구독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의대생 살해’ 피해자, 빈소 없이 장례…“조용히 보내고 싶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전, 1분기 영업익 1.3조… 3개 분기째 흑자 이어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잠수교, 길이 800m ‘가장 긴 미술관’으로… 핑크빛 하늘길도 신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메트로 라이프]경원대 국문학과 이광정 교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