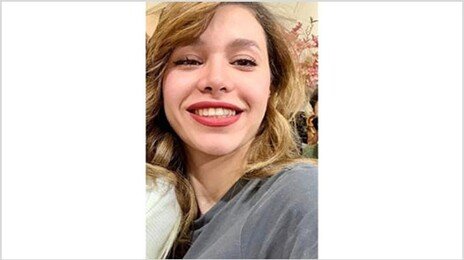공유하기
[극한의 과학자들]<4>중국-몽골 사막의 기상연구소
-
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6분
글자크기 설정

김승범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관과 관련 조사팀이 모래폭풍을 만난 건 지난해 10월 몽골 동고비 사막이었다. 수 km 앞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모래 폭풍이 황사감시기상탑을 설치하던 연구진을 덮치는 데까지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바람에 날아온 굵은 모래와 자갈들이 연구진을 연방 두들겨댔다. 황사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인 몽골 동고비 사막에서 이는 다반사다. 강한 바람과 모래는 황사를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 때문에 최근 기상연구소는 근본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중국과 몽골의 황사 발원지에 거대한 높이의 황사감시기상탑을 꽂은 것이다.》
모래바람 온몸 때려도 황사 감시 선봉에 서서…
○ 중국-몽골서 황사 감시 ‘오감’ 가동
한국으로 불어오는 황사는 주로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대기 중으로 날아오른 모래들이다. 네이멍구의 나이만과 뚜어런, 황토고원의 유린, 중국 고비 지역의 장예, 몽골 동고비 지역의 에르덴이 대표적인 발원지다. 주변 주요 도시 공항에서 내려 험한 길을 자동차로 하루 이틀 꼬박 달려야 다다를 수 있는 외딴 지역이다.
황사 피해를 줄이는 연구는 바로 이 지역의 기상 조건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발원지에서 건조한 날씨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한반도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분다면 한국이 황사에 시달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황사감시기상탑이 바로 황사의 발생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오감’입니다. 발원지의 기온, 풍향, 풍속, 황사 농도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죠.”
지난해 중국과 몽골에 다녀온 김승범 연구관은 몇 년 전만 해도 알 수 없던 다양한 황사 정보를 발원지에 설치한 감시기상탑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개(중국 4개, 몽골 1개)가 설치된 황사감시기상탑은 높이가 20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이다. 전체 모습은 전파 송신탑과 비슷하다.
높이 2, 4, 8, 16m 구간에 길이 70cm가량의 금속 막대가 주기둥과 직각 방향으로 삐져나와 있는 게 특징이다. 금속 막대 끝에 설치된 감지기가 높이별로 기상조건과 황사 농도를 측정해 지상 관측소에 자료를 보낸다. 평소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이지만 황사가 극심한 3∼5월에는 3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한다.
○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받아 세수
발원지로 직접 걸어 들어가 황사감시기상탑을 설치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현지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연구진에게 사막의 가혹한 날씨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난관이다. 황사 방어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물은 연구원들을 특히 지치게 만든다.
“지난해 몽골의 동고비 지역에 갔을 때였어요. 식수는 있었지만 씻을 물을 찾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들른 여인숙에 특이한 세면 장치가 있더군요. 천장에 달린 양동이였는데, 여기에 물을 조금 채운 뒤 양동이 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에서 흐르는 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었어요. 고양이 세수가 따로 없었죠.”
또 다른 문제는 음식이었다. 맵고 짠 음식에 익숙한 한국인 입맛에 몽골의 주식인 양고기는 ‘아니올시다’였다. 느끼한 맛과 특유의 냄새가 연구원들을 괴롭혔다.
“현지 음식은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허기가 져도 배불리 먹긴 어려운 맛이었거든요. 컵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연구원들에게 김치는 그야말로 고마운 존재였다. 느끼한 음식을 먹다가 한 입 베어 문 김치는 청량제와 같았다. 재미있는 건 김치가 현지인들과 원활히 협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황사감시기상탑을 세우는 곳은 완전한 허허벌판이 아닙니다. 작동할 때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일지라도 마을 주변에 설치해야 하죠. 그런데 몽골에 갔을 때, 싸 간 김치를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줬더니 아주 좋아하더군요. 뜻밖이었어요. 그 덕분에 주민들과의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김 연구관은 몽골에서 귀환 도중 길을 잃기도 했다. 도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이 지역에서는 오로지 현지 운전자의 경험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한다.
이때 이정표 노릇을 하는 것이 전신주다.
“3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현지 운전자가 전신주 방향을 잘못 찾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밤이면 완전한 암흑천지로 변하는 몽골에서는 낯선 길을 가다 차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사고가 나는 일이 많다고 김 연구관은 말했다.
올해 김 연구관은 황사감시기상탑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장비들을 적극 활용해 예·경보 정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황사가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분석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이정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sunrise@donga.com
트렌드뉴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3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4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5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6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7
트와이스 지효, 고급 시스루 장착…美 골든글로브 참석
-
8
‘신세계 손녀’ 애니, 아이돌 활동 잠시 멈춘다…무슨 일?
-
9
백해룡, 이번엔 李대통령 겨냥 “파견 자체가 기획된 음모”
-
10
반찬통 착색 고민 끝…‘두부용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알쓸톡]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4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5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6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7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8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트렌드뉴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3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4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5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6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7
트와이스 지효, 고급 시스루 장착…美 골든글로브 참석
-
8
‘신세계 손녀’ 애니, 아이돌 활동 잠시 멈춘다…무슨 일?
-
9
백해룡, 이번엔 李대통령 겨냥 “파견 자체가 기획된 음모”
-
10
반찬통 착색 고민 끝…‘두부용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알쓸톡]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4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5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6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7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8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