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엘리자베스 테일러 1932~2011]김수용 감독의 ‘내 기억 속의 리즈 테일러’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미모에 연기력,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이 시대 이런 배우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침에 배달된 동아일보 1면에서 눈을 끄는 미인의 사진을 보았다. 그동안 ‘미인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굴까. 엘리자베스 테일러였다. 세계 최고의 미인이자 세기의 여배우, 바로 그가 지면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테일러의 모습을 처음 접한 것은 1951년 개봉된 ‘젊은이의 양지’에서였다. 함께 주연한 몽고메리 클리프트는 당대 최고의 미남 배우였는데, 작은 체구에 이름도 생소한 상대 여배우도 클리프트 못지않게 멋졌고 연기를 잘했다. 크고 투명한 보랏빛 눈동자는 다른 푸른 눈동자의 여배우들과 비교했을 때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흔히 배우는 두 갈래로 얘기할 수 있다. 얼굴이 아름답지만 연기를 못 하는 배우, 얼굴은 평범하지만 연기를 잘 하는 배우. 테일러는 얼굴이 아름다우면서 연기를 잘 하는 몇 안 되는 배우였다.
배우의 연기를 이루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목소리와 억양. 연기력과 외양을 웬만큼 갖췄어도 음색이 좋지 않은 배우가 많다. 테일러의 영어 대사는 다른 나라 사람인 내가 듣기에도 감미롭고 섬세했다. 목소리도 매혹적이었고, 억양은 적절한 리듬을 탔다. 1950, 60년대 말도 안 되는 영화심의가 난무하던 한국에서는 영화도, 배우들의 연기도 그 못지않게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런 속에서 영화를 만들던 내게 그의 연기와 영화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감독한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들에게 “왜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느냐”고 종종 꾸지람을 하기도 했다.
당대를 살아간 세계 모든 남성에게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란 이름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1950년대 이미 영화를 찍고 있던 나는 애초 팬보다 감독으로서의 시선이 강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 연기, 작품 등 모든 것은 영화인으로서도 강렬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제임스 딘과 함께 열연한 ‘자이언트’(1956)에서 미국 텍사스 주의 광활한 모래사막을 배경으로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딘과 티격태격하던 ‘레슬리’ 테일러의 모습을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 시대에 다시 그런 배우가 나올 수 있을까. 나는 회의를 품게 된다. 요새 잘나가는 여배우들의 훌륭하다는 부분들만 모아 모자이크처럼 붙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테일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그 같은 여배우를 내 영화에 쓰고 싶다는 생각도 감히 해본 적 없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내 영화에 나온 여배우들은 모두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려 노력했다.
김수용 영화감독·전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트렌드뉴스
-
1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2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3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4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5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6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7
공들인 시니어주택, 휴가 반납하고 찾은 회장님[부동산팀의 비즈워치]
-
8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9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10
[사설]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전현무 “고인에 예 다하지 못했다”…칼빵 발언 사과
트렌드뉴스
-
1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2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3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4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5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6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7
공들인 시니어주택, 휴가 반납하고 찾은 회장님[부동산팀의 비즈워치]
-
8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9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10
[사설]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전현무 “고인에 예 다하지 못했다”…칼빵 발언 사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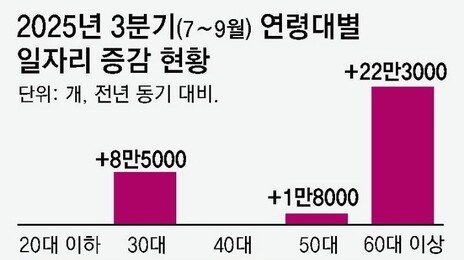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