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엘 킴벡의 TRANS WORLD TREND]파리 패션위크, 과감하고 변화무쌍하지만 안정적인 스타일 잔치
- 동아닷컴
글자크기 설정

파리에 도착하면 따뜻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파리는 뉴욕보다 추웠다. 봄인 줄 알았는데 차게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었다. 2013, 2014년 가을·겨울 시즌을 겨냥해 열린 이번 파리 패션위크는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많아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부터 파리 패션 브랜드들의 수장이 대폭 바뀌면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시즌부터 새롭게 컬렉션을 이끌고 있는 디오르의 라프 시몬스와 생로랑의 에디 슬리만에게는 이번 시즌이 앞으로의 행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통적으로 패션 브랜드들은 봄·여름 시즌보다는 가을·겨울 시즌 의상에 더 공을 많이 들인다. 단가도 더 비싸고,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을·겨울 시즌 의상을 선보이는 이번 컬렉션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라는 예측이 높아졌다. 2년차 또는 두 번째 시도 때 첫 번째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해 실망시키는 ‘소포모어 징크스’가 생기면 어쩌나 두려워하는 시각도 있었다.
1일 열린 시몬스의 디오르 쇼는 그가 이 패션 하우스에 완벽히 적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전에 디오르를 이끌었던 존 갈리아노 쇼에 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덜해 아쉬웠다. 파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유서 깊은 패션하우스, 발렌시아가 역시 이번 시즌 새로운 디자인 수장을 맞이했다. 뉴욕 컬렉션에서 승승장구하던 중국계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이 그 주인공. 지난 15년간 발렌시아가의 디자이너로 활약하면서 이 브랜드를 패션계의 중심으로 이끈 니콜라 게스키에르에 이어 책임 디자이너로 발탁된 그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새로운 디자이너로 발탁돼 2년째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 미야마에 요시유키의 컬렉션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기존의 이세이 미야케가 가진 소재의 장점을 살리면서 컬러감을 더해 주목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영국의 체크 패턴들을 응용한 다양한 룩을 선보였다.
최근 다양한 색감과 과감한 디자인으로 젊은 브랜드로 환골탈태한 ‘겐조(오른쪽)’ 역시 디자인 수장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뉴욕의 편집숍 ‘오프닝 세리머니’의 두 수장, 움베르토 레온과 캐럴 림은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아이템들을 쏟아냈다. 다소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이 브랜드는 두 주역에 힘입어 패션피플이 사랑하는 ‘잇(it) 브랜드’로 떠올랐다. 그러나 급격한 변신에 한편으로는 겐조의 오랜 고객들을 잊은 건 아닌지 아쉽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브랜드 ‘빈폴’과 협업한 경험이 있는 두 디자이너 역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하우스의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루이뷔통의 남성복 디자이너로 활약하는 영국 출신의 킴 존스, 에르메스의 디자이너인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토프 르메르다.
파리=조엘 킴벡 패션 칼럼니스트 joelkimbeck@gmail.com
조엘 킴벡의 TRANS WORLD TREND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e글e글
구독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3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4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5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6
“주인 찾아 260km 국경 질주” 5개월 만에 고양이가 돌아와
-
7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8
막걸리 학원에 나타난 박나래 “뭐라도 해야죠”
-
9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0
“초봉 6천만원에 숙식 무료”…꿈의 직장인데 극한직업 어디?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3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4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7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8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9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3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4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5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6
“주인 찾아 260km 국경 질주” 5개월 만에 고양이가 돌아와
-
7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8
막걸리 학원에 나타난 박나래 “뭐라도 해야죠”
-
9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0
“초봉 6천만원에 숙식 무료”…꿈의 직장인데 극한직업 어디?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3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4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7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8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9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조엘 킴벡의 TRANS WORLD TREND]쾌속 유행 돌풍의 주역, 스웨덴-덴마크 패션 주의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03/27/54006998.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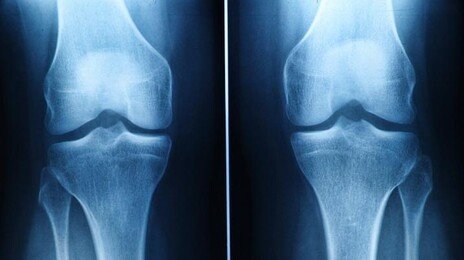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