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커버스토리]당당하고 섹시한 파워우먼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뉴 센슈얼리티’ 코드, 세계 4대 컬렉션 휩쓸어
1960년대 룩-동양적 영감, 패션 주류로 떴다

해마다 두 차례. 올가을에도 어김없이 뉴욕 밀라노 파리 런던 등 현대의 패션 메카에서 열린 컬렉션에서 화두가 된 이벤트 중 하나는 크리스티앙 디오르와 이브생로랑의 패션쇼였다. 현재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두 패션 천재, 라프 시몬스(44)와 에디 슬리만(43)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브랜드의 첫 기성복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두 거물이 나란히 경쟁 브랜드를 대표해 도전에 나선 이례적 상황인 만큼 두 사람의 대결 구도에 초점을 맞춘 파리 컬렉션발 외신 기사도 쏟아져 나왔다. 우먼스웨어데일리는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파리 패션계의 얼굴이 바뀐다는 의미의 ‘파리 페이스오프(face-off)’란 제목을,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챔피언끼리의 경쟁’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시몬스는 미니멀한 브랜드인 질샌더의 부활을 이끈 주인공이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존 갈리아노와 완벽히 단절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성향의 시몬스를 택했다는 얘기가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과장을 조금 보태 갈리아노가 ‘스타병’ 환자라면 시몬스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만큼 두 사람의 유전자는 완전히 상반된다.
스타 디자이너들의 이적이 화제가 되며 업계 전체가 술렁인 올해는 특히 ‘전환의 해’로 기록될 듯하다. 불황, 그 속에서 부르짖는 희망, 새 임무를 맡게 된 스타 디자이너들의 중압감 등이 무지개처럼 흩뿌려지며 내년 봄·여름은 또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기약하게 됐다. 트렌드 정보사 인터패션플래닝의 조언으로 4개 컬렉션에서 선보인 주요 테마를 정리했다.

뉴 센슈얼리티
남성의 턱시도를 연상케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섹시한 느낌의 컬렉션도 ‘뉴 센슈얼리티’란 큰 테마로 분류할 수 있다. 시몬스의 크리스티앙 디오르 컬렉션이 대표적이었다. 이브생로랑의 브랜드 유전자에 깊숙이 새겨진 ‘르 스모킹’을 경쟁 브랜드 디오르를 통해 쏟아낸 것은 우연이었을까, 의도적 연출이었을까. 디오르 측은 브랜드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bar) 재킷’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꽃무늬가 새겨지고 ‘공주 치마’처럼 부풀려진 풀스커트 등 좀 더 화려한 아이템도 대거 선보였다.
센슈얼한 요소를 다양하게 풀어낸 그의 컬렉션은 주로 평론가와 패션 매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속이 비치는 시어 소재를 대거 사용한 점, 또 코르셋을 겉옷처럼 입은 뷔스티에 스타일의 상의가 많이 등장한 점도 센슈얼한 요소로 지목됐다. 인터패션플래닝은 특히 시어 소재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드레스, 스커트, 팬츠, 심지어 외투에도 사용된 시어 소재는 내년 봄여름 컬렉션의 핵심 요소로 부각됐다.
1960’s
과거에서 답을 찾는 복고 무드는 올해도 반복됐다. 특히 루이뷔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크제이컵스는 ‘백투더퓨처’에 등장한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1960년대를 여행하고 돌아온 듯 그 시대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었다. 옵아트(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해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추상미술), 블랙&화이트의 그래픽,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2013년 버전의 1960년대 룩이 무대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실물 사이즈의 기차를 쇼장에 들여온 제이컵스와 루이뷔통의 통 큰 도전정신은 올해는 대형 체스판을 연상케 하는, 흰색과 노란색을 교차시킨 유리 바닥으로 변형됐다. 체스판 혹은 루이뷔통 핸드백의 다미에 라인을 연상시키는 무늬로 치장한 모델들은 초대형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유유히 내려오며 그 자태를 뽐냈다.
1960년대의 대표 아이콘인 미니스커트 역시 다양하게 선보였다. 체크무늬는 때로는 세로 스트라이프로 변형돼 늘씬한 느낌을 주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모델들이 들고 나온 핸드백은 LV 로고와 벚꽃 모티브가 담긴 모노그램 라인보다 체크무늬처럼 보이는 다미에 라인에서 변형된 것이 더 많았다. WWD 등 패션매체들은 이를 두고 “컬렉션과의 통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품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등 신흥시장 고객들이 더는 LV 로고 플레이에 감동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성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가 뉴욕 컬렉션에서 자신의 이름을 달고 선보이는 ‘마크제이컵스’ 쇼에서도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묻어났다. 좀 더 섹시하거나 캐주얼한 버전의 의상을 선보였다.
뉴욕 디자이너 마이클 코어스는 1960년대를 풍미한 프랑스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주에서 영감을 받았다. 블랙, 레드, 옐로 등 강렬한 색상을 대담한 프린트와 함께 매치하면서도 촌스럽거나 과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만의 재주일 터.
샤넬의 카를 라거펠트 역시 분홍과 회색이 교차되는 투피스를 고상한 버전으로 풀어냈다. 샤넬 쇼에서 많은 이의 시선을 모은 오브제 중 하나는 모델이 어깨에 걸치거나 손에 들고 나온 훌라후프였다. 자세히 보면 아랫부분이 가방이다. 만약 이 아이템을 내가 구입하게 된다면 훌라후프로도, 가방으로도 쓰기 아까울 듯. 미술작품처럼 벽에 곱게 걸어놓고 바라만 볼 것 같다.
밀라노에서도 1960년대의 키치적 분위기를 녹인 60년대 파워가 눈에 띄었다. 모스키노, 프라다 등이 패턴 전반에 걸쳐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면서 팝아트적 분위기를 냈다. 베르수스는 대담한 기하학적 패턴을 선보였다. 다이아몬드 패턴을 다양한 색상으로 풀어낸 디자인은 어딘지 모르게, 복고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냈다.
아시아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는 유럽과 미국을 대신할 희망은 역시 동양이었을까. 과거 영감의 원천으로만 생각해 가늘게 눈을 뜨고 동쪽을 바라봤던 서양 디자이너들은 이제 좀 더 애절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동쪽, 동양을 외치고 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커버스토리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트렌드뉴스
-
1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4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5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6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7
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
8
이해찬 前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중 한때 심정지
-
9
“고수익 보장”에 2억 맡긴 리딩방 전문가, AI 딥페이크였다
-
10
고교 중퇴 후 접시닦이에서 백만장자로…“생각만 말고 행동하라”[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트렌드뉴스
-
1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4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5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6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7
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
8
이해찬 前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중 한때 심정지
-
9
“고수익 보장”에 2억 맡긴 리딩방 전문가, AI 딥페이크였다
-
10
고교 중퇴 후 접시닦이에서 백만장자로…“생각만 말고 행동하라”[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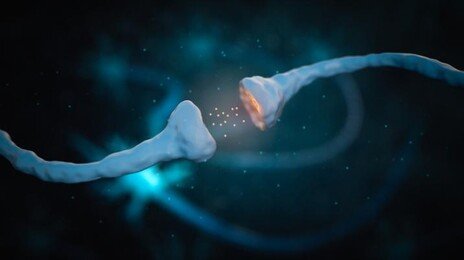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