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O2/민화의 세계]부부인가… 연인인가… 물속 꽃놀이 정겨워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1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 어해도

“정약전은 자산(玆山, 흑산도의 흑산·黑山을 바꿔 부른 말) 바다의 물고기들의 종류와 생김새와 사는 꼴을 글로 적어 나갔다. 글이 물고기를 몰아가지 못했고, 물고기가 글을 끌고 나갔다. 끌려가던 글이 물고기와 나란히 갔다.”
― 김훈의 ‘흑산’ 중에서
조선왕조가 천주교도를 박해한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경북 포항의 장기로 귀양을 갔다. 그의 둘째 형인 정약전(丁若銓·1758∼1816)은 전남 흑산도로 보내졌다. 정약전은 그곳에 머물며 바닷물고기의 생태를 관찰한 ‘자산어보(玆山魚譜)’를 지었다. 그는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물고기의 언어를 인간의 그것으로 해석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유배 생활에서 몰려오는 외로움을 견디고, 두려움을 잊기 위한 그만의 방법이었다.
극적이고 사실적인 장한종의 쏘가리
정조(1752∼1800) 재위 시절인 18세기 후반은 조선의 문화가 르네상스를 맞이한 때였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어해도의 중심에는 궁중화원인 장한종(張漢宗·1768∼1815)이 우뚝 서 있었다. 풍속화와 진경산수화처럼 사실적인 화풍이 대세를 이뤘던 시기, 그의 어해도 역시 사실성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장한종은 여러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유재건(劉在建·1793∼1880)의 책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도 등장한다. 이 책은 중인 이하 계층인 여항인(閭巷人)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장한종은 어릴 적 숭어, 잉어, 게, 자라 등을 사서 그 비늘과 등딱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본떠 그렸다고 한다. 그림이 완성되면 그 핍진(逼眞·실물과 똑같이 닮음)함에 찬탄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책은 전한다.
원래 쏘가리 그림은 과거 급제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쏘가리의 한자 표기인 ‘궐어(魚)’ 중 ‘궐()’자가 ‘궁궐(宮闕)’의 ‘궐(闕)’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한종의 쏘가리 그림은 어부사의 내용과 함께 과거 급제라는 현실적 염원까지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속에서는 사선 방향으로 드리운 복숭아 가지 위아래로 쏘가리들이 자유롭게 노닐고 있다. 특히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몸을 휘면서 내려오는 쏘가리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맛볼 수 있다. 작가는 입체적으로 몸을 표현하고 치아까지 그려 넣어 사실성을 견지했다. 그러면서도 풍부한 ‘붓맛’을 통해 시적인 정취를 한껏 살렸다.
해학적이고 도식적인 민화의 쏘가리
궁중에서 유행한 어해도는 19세기 후반 민간으로 옮겨지면서 오히려 더 성대한 불꽃을 태우게 됐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림에 등장하는 어종이 대폭 늘어났고, 토착화의 경향마저 나타났다. 동해와 맞닿은 곳에서는 갈치, 학꽁치, 문어, 청어, 개복치를 등장시켰고, 서남해에선 아귀, 홍어, 쏠종개, 웅어, 성대, 망둑어를 그렸다. 지역색이 뚜렷해진 것이다.
강원 영월의 조선민화박물관에 소장된 민화 ‘쏘가리’에서는 장한종과 차별화된 해석이 돋보인다. 화면 위에는 ‘복숭아꽃 흐르는 물에 쏘가리가 살찐다’는 장지화의 시가 적혀 있다. 그러나 민화 작가는 사실적인 표현 대신 쏘가리가 복숭아꽃을 머금으며 희롱하는 시적 은유를 택했다. 패턴도 도식적으로 재구성했다. 다른 민화 중에는 쏘가리의 얼룩무늬를 아예 복숭아꽃 문양으로 그린 것도 있다.
민화 어해도의 매력은 사람처럼 의인화된 어류들의 표정과 웃음을 머금게 하는 해학적 표현에 있다. 새우의 다리와 더듬이가 어느새 사람의 팔다리로 변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곁에 있는 게들도 그 흥겨움에 딱딱한 몸을 들썩인다. 겁을 먹고 무리지어 도망가는 송사리 떼를 앞뒤로 가로막은 물고기들이 한번에 빨아들일 기세로 큰 입을 벌리기도 한다.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우울함을 지우려는 정약전의 필사적인 노력이나 물상을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장한종의 진지함은 없다. 대신 세상을 밝게 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유쾌함과 명랑함이 화면 가득히 묻어난다.
물고기 그림을 방에 족자로 걸어놓거나 병풍으로 꾸며놓아 보자. 그러면 어항을 들여놓았거나 조금 과장하면 마치 수족관에 온 것 같은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민화 어해도에는 부부 금실이 좋아서 자식을 많이 낳고 그들이 자라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행복의 염원이 깃들어 있으니 금상첨화가 아닌가.
정병모 경주대 교수(문화재학)·한국민화학회 회장 chongpm@gju.ac.kr
트렌드뉴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치통에 현금 2억, 안방엔 금두꺼비…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1억 압류
-
3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
4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5
홍준표 “법왜곡죄, 박정희 국가원수 모독죄 신설과 다를 바 없어”
-
6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7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
8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9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찾아 환한 미소…홍라희도 함께
-
10
신동 “부모와 연락 끊어…항상 큰돈 원하고 투자 실패”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4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10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트렌드뉴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치통에 현금 2억, 안방엔 금두꺼비…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1억 압류
-
3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
4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5
홍준표 “법왜곡죄, 박정희 국가원수 모독죄 신설과 다를 바 없어”
-
6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7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
8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9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찾아 환한 미소…홍라희도 함께
-
10
신동 “부모와 연락 끊어…항상 큰돈 원하고 투자 실패”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4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10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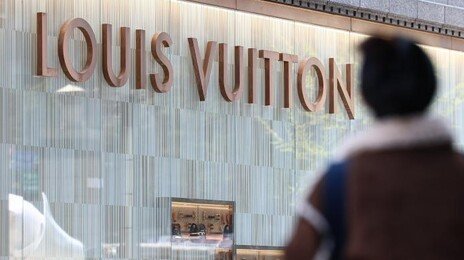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