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O2/내 인생을 바꾼 공간]“젊은 학생들이 나누는 마약-근친상간 얘기에 ‘화들짝’, 그 충격 덕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9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내 인생을 바꾼 공간 송승환의 뉴욕! 뉴욕! 뉴욕!
내가 난타를 만든 건, 뉴욕 3년의 ‘충격’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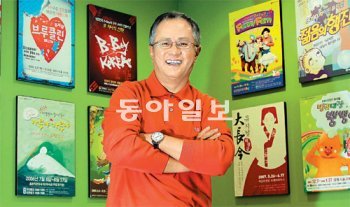
《 “칩 프라이스(cheap price·싸다 싸)! 칩 프라이스!”
경마장 주차장 한 칸에 좌판을 놓고 각종 시계를 줄줄이 늘어놨다. 옆 칸에서는 유대인 할머니가 “뭐든지 1달러”라고 중얼대며 폐업한 식당에서 떼 온 포크, 나이프, 접시 등속을 팔았다. 노점 경력이 꽤 된 베트남계 남성이 다가왔다. “‘싸다, 싸’라고 하면 정말 싸구려처럼 느껴진다고.
굿 프라이스(good price·좋은 가격)! 라고 외쳐요.” 듣고 보니 그랬다. 바로 바꿨다. “굿 프라이스! 굿 워치(좋은 시계요)! 체크 잇 아웃(check it out·구경하세요)!” 경마가 열리지 않는 날이면 주차장은 큰 벼룩시장으로 변했다. 이곳은 뉴욕. 1985년, 송승환(54)은 거기에 있었다. 》
‘뉴욕행 대차대조표’
1980년대 전반기 송승환은 한국 대중문화계의 총아였다. 연극, 영화, 드라마, TV쇼 진행자, 라디오 DJ까지 그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었다. ‘10대 소녀들의 우상’이란 말은 너무 들어 식상할 정도였다. 돈이 굴러들어왔다. 그런 그가 1985년 1월 갑자기 미국에 가겠다고 하자 주위에서는 상당히 의아해했다. ‘자기가 무슨 돈키호테인 줄 아나.’
그의 머릿속에는 1983년 처음 가봤던 뉴욕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브로드웨이의 수많은 극장과 그곳들을 언제나 채우고 있는 각종 공연. 정말로 보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에 가득했다. 게다가 식을 줄 모르는 인기는 분 단위로 쪼개 써야 할 정도로 스케줄의 폭주를 가져왔다. 너무나 피곤했다. 아역배우부터 시작한 이 일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진저리가 났다.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침’ 성쇠를 거듭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벌어놓은 돈으로 겨우 빚을 다 갚았다. 어머니 아버지께 단칸 사글셋방을 얻어 드렸더니 남는 것이 없었다.
공책을 펼쳐 세로로 길게 줄을 쳤다. 한쪽에는 ‘미국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한쪽에는 ‘미국에 갔을 때 잃을 수 있는 것’을 써내려갔다. 이른바 ‘뉴욕행 대차대조표’. 1977년 연극에 흠뻑 빠져 대학을 중퇴할 때도 대차대조표를 그렸다. 한쪽에는 ‘대학졸업장이 없어 이 사회에서 받게 될 어려움’을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다른 한쪽에는 ‘연극을 했을 때 생기는 이득’을 열거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였다. 다른 것들은 극복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뉴욕행 대차대조표의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업 실패와 동시에 쓰러져서 가벼운 뇌중풍(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다. 외아들에 장남이라 집안을 지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부모의 호구지책을 위해 지방에서 작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선배에게 부탁해 병원매점 운영권을 얻어드렸더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인풋(Input)
뉴욕 지하철 객차에 붙은 뮤지컬 ‘캐츠(CATS)’의 공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흐흠, 우리 거랑 큰 차이가 없네.’ 제목, 사진, 극장, 그리고 공연 날짜가…. 헉, 숨이 멎었다. ‘앞으로도 계속(Now and forever).’ 한국에선 장기 공연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한 달이었다.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이런 공연이 가능할까.
3년 6개월간의 뉴욕 생활은 이런 충격을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영화 관련 수업을 청강하던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에서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이 단편영화 주제를 놓고 마약, 근친상간 같은 소재로 토론하던 광경도 신선했다. 한국 같으면 언감생심일 이야기를 하는 그들은 자유로웠다. 머스 커닝엄의 무용 공연도 봤다. 내내 무용수들이 걸어다니다 풀썩 쓰러지거나 뛰어다니기만 했다. 그런데 자신만 빼고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쳐댔다. 희한한 경험이었다. 뉴욕에선 많은 ‘다름’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그 다름은 인정받고 있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뮤지컬들, 해외토픽에서나 겨우 읽어야 했던 공연들, 당시 한국에서는 몇 편 수입되지도 않던 영화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부족했다. 한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갈증은 서서히 해소돼 갔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했다. 한 여성월간지 기자는 뉴욕에서 그를 만난 다음 ‘송승환, 뉴욕에서 좌판 깔고 시계장사’라는 기사를 썼다. 한국에서 잘나가던 스타가 미국에서 생고생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는 사람에게 들으니 서울시내 광고전광판에 한 달간 그 제목이 떠있었다던가….
“고생 안 했어요. 남들이 고생했다고 그러지. 아내가 남들 발을 닦아주는 궂은일을 해야 하니 조금 미안은 했지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즐겼어요. 재미있게. 다행이지요.”
뉴욕은 그의 생애 가장 큰 인풋(Input·투입)이었다. 자신에 대한 3년 6개월간의 집중적인 인풋이었다. 거기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이 나중에 ‘난타’를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됐다.
다음은 ‘웨딩’
뉴욕에서 돌아온 송승환은 쉴 새 없이 달려왔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비언어극 ‘난타’를 무대에 올린 지도 벌써 15년째다. 퍼포먼스(P)와 뮤지컬(M), 영화(C)를 고루 제작하겠다며 만든 회사, PMC프로덕션도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난타’가 여전히 회사의 주 수입원이다. 흡족한 것만은 아니다. ‘난타’ 이후 몇 가지 비언어극을 내놨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래도 다시 도전한다. 내년에는 결혼식과 결혼피로연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묶어 음악과 함께 펼치는 비언어극을 내놓을 생각이다.
그는 요즘 다시 자신에게 인풋이 필요한 시기라고 느낀다. 그동안 아웃풋(Output·산출)만 넘쳐났다. 2013년쯤 모든 직을 잠시 쉬면서 재충전한 뒤 65세까지 버티겠단다. 그럼 지금까지 그의 삶의 대차대조표는 어떤 결과를 내놓고 있을까.
“비교적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성취는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엄청난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성공, 실패는 죽을 때 판단해야겠죠.” 그에겐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은 것 같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단독]“피지컬AI 신경망 깔아라”… 민관 ‘한국형 스타링크’ 시동
-
2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3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4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7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8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9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10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3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4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5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6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7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불법주차 스티커 떼라며 고래고래”…외제차 차주 ‘경비원 갑질’
-
10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트렌드뉴스
-
1
[단독]“피지컬AI 신경망 깔아라”… 민관 ‘한국형 스타링크’ 시동
-
2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3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4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7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8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9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10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3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4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5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6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7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불법주차 스티커 떼라며 고래고래”…외제차 차주 ‘경비원 갑질’
-
10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