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변화’ 연작 선보인 오수환 전
-
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오수환 서울여대 서양화과 교수가 여러 곳에서 밝힌 회화관을 정무정 덕성여대 교수가 평론에서 소개한 대목이다. 오 교수에게 작품은 서양의 재료를 가지고 동양의 명상을 표현하는 과정, 즉 오랜 침묵과 기다림 끝에 번개처럼 번뜩이는 깨달음의 표현 과정인 것이다. 그는 “화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비슷한 직관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리씨갤러리(02-3210-0467)에서 5월 30일까지 작품전을 연다. 프랑스 전시 이후 2년 만에 여는 이 전시에서 관객들은 얼마나 작가의 직관적 행위에 공감할 수 있을까…. 오 교수가 이전에 발표한 ‘곡신(谷神)’ ‘적막(寂寞)’ 시리즈에 이어 내놓은 ‘변화’ 연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푸른색이나 회색이 대담한 붓질의 흔적을 안고 화면의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여러 색의 선이나 점들이 찍혀 있다. 그 선이나 점은 정형이 없으며 때로는 기운찬 직선으로, 때로는 깃털처럼 가벼운 곡선으로 움직인다. 오 교수는 새의 깃털을 이용해 선의 맵시를 표현할 때도 있다. 바탕의 두꺼운 색면은 오랜 기다림이나 침묵의 바다를 가리키고, 선이나 점은 순간에 번뜩이는 ‘새로운 해석’인 셈이다.
오 교수는 화면의 바탕과 선의 충동을 느끼기 위해 1년을 기다릴 때도 있다. 작품을 만들어가는 행위와 그 속에 관객을 동참시키는 과정을 통해 속도가 미덕이 돼 버린 현대 생활에 한방 먹이는 셈이다. 선 중에는 고대 쐐기형 문자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도 있다. 그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착했지 않았느냐”며 웃는다.
허 엽 기자 heo@donga.com
트렌드뉴스
-
1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2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3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4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5
트럼프 “대규모 함대 이란으로 이동 중…베네수 때보다 더 큰 규모”
-
6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7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8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9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10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장기 투자자… 20~30대 수익률의 2배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3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4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5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6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7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
10
“불법주차 스티커 떼라며 고래고래”…외제차 차주 ‘경비원 갑질’
트렌드뉴스
-
1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2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3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4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5
트럼프 “대규모 함대 이란으로 이동 중…베네수 때보다 더 큰 규모”
-
6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7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8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9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10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장기 투자자… 20~30대 수익률의 2배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3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4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5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6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7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
10
“불법주차 스티커 떼라며 고래고래”…외제차 차주 ‘경비원 갑질’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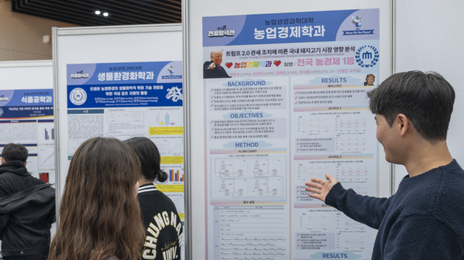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