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말데이트]‘꽃들은 어디로 갔나’ 발표한 소설가 서영은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중견소설가 서영은씨(61)가 계간 ‘작가세계’ 가을호에 발표한 신작 중편 ‘꽃들은 어디로 갔나’가 유난히 눈에 띈 것은 이런 목마름 때문인지도 모른다. ‘꽃들은…’은 전처가 죽자 연인을 아내로 맞은 노인과 연인에서 아내로 역할을 바꾼 여인의 이야기다.
두 사람의 열정은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생활 속으로 녹아들면서 오히려 건조해진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가 결국 욕심 많고 인색하고 사랑과 자신을 철저히 소유하려는 사람이었음을 깨달으면서 당혹스러워한다. 어느 모로 보나, 작가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글이다.
작가는 스물네 살 때(1967년) 문단의 거목 김동리를 만나 87년 결혼했다. 90년 김동리가 뇌중풍으로 쓰러진 뒤 95년 사별했다. 그 기나긴 열정과 투쟁, 고통, 환희, 격정을 거치고 이제 서영은은 비로소 김동리를 뛰어넘은 것일까. 마침내 그녀가 도달한 ‘사랑법’은 무엇일까. 서울 종로구 평창동 그의 집 근처 찻집에서 작가를 만났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열정을 사랑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 열정은 욕망이고 욕망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다 내려놓아 넘쳐서 주변을, 자기가 아닌 타인을 채우는 것이다.”
―당신의 사랑도 욕망이었나.
“그렇다. 다만 ‘사랑’이라는 화두를 끌어안고 변주를 하다 보니 지금에 이른 거다. 옛날에는 한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나를 더 내려놓고 타인 속에서 죽어야 한다. 내게 사랑은 깨달음의 과정, 구도의 과정이었다.”
―어떻든 사랑은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랑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닌가.
“사랑을 내가 만든 동사로 바꾸면 ‘치러내고 살아내야 한다’이다.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충만해지고 차고 넘친다. 사람들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이러니까 넌 이래야 한다’고 한다. 거기서 충돌과 상처가 생긴다. 충돌과 상처는 ‘나’라는 에고에 빠졌기 때문이다.”
―에고란 무엇인가.
“내가 어떠어떠하다는 ‘틀’이다. 삶은 물처럼 흐르는 거다. 에고는 흐르는 물 위에 프레임을 찍으려 하는 거다. 이건 왜곡이고 오해다.”
―당신의 작품에선 주로 여성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것은 불평등한 것 아닌가.
“애초에 여성, 남성이라는 경계도 모호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랑을 더 잘 할 수 있다. 받아내고 키워내고 치러내고 살아내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내 것을 못 챙긴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선 투쟁과 상처밖에 안 남는다. ‘내 것’ ‘네 것’이라는 칸막이를 치우고 ‘공유’라고 생각하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지난해 환갑을 치르셨다. 나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늙는다는 것은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일이며,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삶에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다.”
―행복한가.
“큰 매듭을 푼 것 같다. 이제 만사형통이다(웃음). 자의식이 없어지니 그저 세상 속에 젖어 산다. 삶은 살수록 재미나다. 사랑 하나 완성하기에도 생은 벅차다.”
그의 눈빛은 맑았다. 그리고 자주 소리 내어 ‘깔깔’ 웃었다. 그 낯빛이 무구하고 낙천적이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주말데이트 >
-

알쓸톡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테크챗
구독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딱 걸린 차주 결국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5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6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7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8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9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10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정보사 ‘공작 협조자’였다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4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5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6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7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8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9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딱 걸린 차주 결국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5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6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7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8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9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10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정보사 ‘공작 협조자’였다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4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5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6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7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8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9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주말데이트]장편극화‘1001’인터넷연재 만화가 양영순씨](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09/17/692932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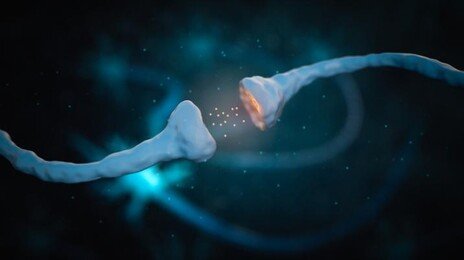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