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온 상승으로 육상 김 양식 불가피
10월부터 4월까지 생산되는 김은 섭씨 5~15도에서 자란 것이 품질이 좋다. 하지만 수온이 올라가면 양질의 김 생산이 어려워진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55년간(1968~2022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이 약 섭씨 1.36도 상승했다. 이는 전 지구 평균보다 약 2.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생장 시 온도에 민감한 김에는 치명적이다.
기후 위기로 수온이 점차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김 재배량은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여 육상양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해조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식품위생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품질관리가 쉬운 육상양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육상양식은 수온과 빛 등 생육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고품질 김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해양오염이나 자연재해 위험에서 자유로워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김에 생기는 질병인 갯병도 예방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 기술로 꼽힌다.
정부의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 공모사업은 2029년까지 종자생산(120억 원), 시스템·품질관리(230억 원) 두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종자생산 분야는 육상양식 적합 품종을 선별하고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스템·품질관리 분야는 김 연중 생산 육상양식장 구축과 품질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남도-해남군-CJ제일제당은 국내 최대 물김 생산지의 노하우와 CJ의 글로벌 유통망을, 전북도-풀무원-대상은 새만금 권역의 넓은 부지와 풀무원의 식품가공 기술을, 제주도-동원F&B는 청정 용암해수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각각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남군은 김 산업 진흥구역과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지정으로 실증 연구가 가능하고 업계 최초로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의 노하우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2022년부터 풀무원과 공동 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김 육상양식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또 공주대, 군산대 등과 협력해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동원F&B와 지난해 10월 김·해조류 육상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원F&B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수온이 연중 15℃ 내외로 안정적인 제주 용암해수를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각 자치단체는 이번 공모 사업을 지역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단순한 김 생산을 넘어 양식 기자재 산업, 가공식품 산업 등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공모사업 선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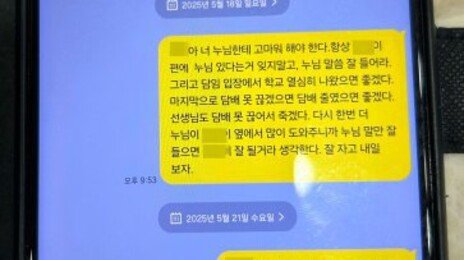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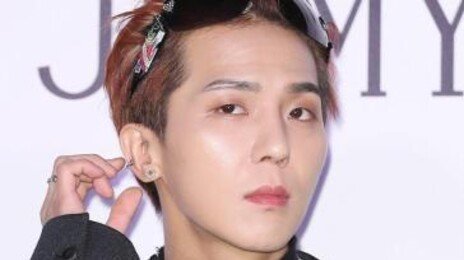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