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점원 일처리 더뎌도 기다려주는 美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1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8월의 주제는 ‘國格’]<165>장애인 배려 갈길 먼 한국

소아암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초등학생 딸을 둔 직장맘 A 씨(42)는 주말에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외출할 때마다 이 세상에 딸과 자신 둘만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모두 바삐 걸음만 재촉할 뿐 도움을 주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13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며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B 씨(41)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나 쇼핑몰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혼자 돌아다니는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있다”며 “한국도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고생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물이 날 때가 많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는 국격을 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멀다.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2014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중고교생 보호자 4180명 가운데 22.1%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 때문에 자녀의 취업이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보호자 8400명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89.8%는 “(장애인 자녀가) 방과후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 탓에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탓이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전체의 47.1%에 이르렀다.
성기창 한국재활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1990년대부터 건축물 시설기준을 ‘장애인 전용’에서 ‘장애물이 없는’으로 바꿨다”며 “장애인 배려는 제도나 법 이전에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그들이 어떻게 불편 없이 살도록 해줄 것이냐 하는 생각의 문제”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트렌드뉴스
-
1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2
[속보]법원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절차적 요건 갖추게 해”
-
3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4
‘50만원짜리 김밥’ 알고보니…환불 반복에 자영업자 폭발했다[e글e글]
-
5
“버스 굴러온다” 온몸으로 막은 70대 어린이집 기사 사망
-
6
“내가 바나나야” 원숭이 유인하려 주렁주렁…선 넘은 관광객
-
7
설악산 ‘유리 다리’ 아찔?…공원측 “거짓 정보로 업무 마비”
-
8
82세 장영자 또 사기… 유죄 확정땐 6번째
-
9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10
‘술방’ 찍다 만취한 권상우 “술 약한데 벌컥벌컥…죄송”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6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장동혁 만난 이준석 “양당 공존, 대표님이 지휘관 역할 해야”
트렌드뉴스
-
1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2
[속보]법원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절차적 요건 갖추게 해”
-
3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4
‘50만원짜리 김밥’ 알고보니…환불 반복에 자영업자 폭발했다[e글e글]
-
5
“버스 굴러온다” 온몸으로 막은 70대 어린이집 기사 사망
-
6
“내가 바나나야” 원숭이 유인하려 주렁주렁…선 넘은 관광객
-
7
설악산 ‘유리 다리’ 아찔?…공원측 “거짓 정보로 업무 마비”
-
8
82세 장영자 또 사기… 유죄 확정땐 6번째
-
9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10
‘술방’ 찍다 만취한 권상우 “술 약한데 벌컥벌컥…죄송”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6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장동혁 만난 이준석 “양당 공존, 대표님이 지휘관 역할 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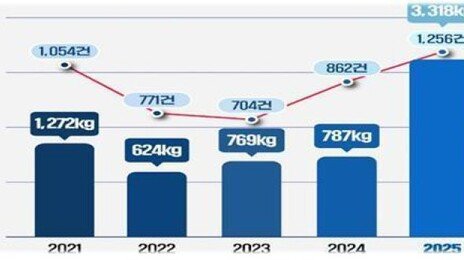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