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과 내일/최영훈]이명재 특보 ‘레이저’ 세 번만 쏘여라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2002년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다. 이명재 검찰총장과 그의 집 부근 식당에서 단둘이 만났다.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벌집을 쑤신 듯 복잡할 때였다. 만나자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갔다. 결론으로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검찰 내부의 의견도 그렇게 모아졌다.
이 총장은 묵묵히 술잔만 기울였다. 술잔이 몇 순배 더 돌아갔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라며 혼잣말처럼 입을 뗐다. 이 총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는 사퇴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몰랐다. 사흘 뒤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표를 냈다.
검찰이 신뢰를 얻으려면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한다. 그는 총장 취임사에서 “진정한 무사는 겨울날 얼어 죽을지언정 곁불을 쬐지 않는다”고 했다. 후배 검사에게 한 말이면서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다. 10개월 남짓 짧은 재임 기간 중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됐다. 그의 집무실에는 글씨나 그림 한 점 없었다. 책장엔 법전 한 권만 놓여 있었다. 떠날 때도 007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다.
지금 박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뒤 가장 힘든 순간을 맞고 있다. 대통령의 위기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성공한 특보가 되려면 한 달에 한두 번은 대통령과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를 만들어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특별 보좌’ 성공의 요체다. 청와대나 내각의 공식 라인에서 듣지 못한 한두 가지 보고를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김광준 검사 뇌물 수수 사건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을 때다. 이 특보를 비롯한 전직 검찰총장들을 만찬에 초청해 의견을 구하자 그들은 “상황을 잘 몰라서…”라며 입을 열지 않았다. 한 총장이 “‘총장이 물러나선 안 된다’며 검사들이 찾아오더라”고 말해도 이 특보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자리를 파할 무렵 이 특보는 “검사들이 찾아오는 그때가 바로 그만둬야 할 때”라고 했다. 떠날 때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박 대통령은 첫 공식 석상에서 이 특보를 바로 옆자리에 앉힌다. 특보 중 좌장인 그에게 예우를 하는 셈이다. 당 태종에게 200번 넘게 간언을 한 위징(魏徵)이 청나라 때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었다. 당나라 때는 왕과 신하가 마주 보고 얘기할 수 있었다. 청나라 때 왕은 저 멀리, 높은 곳에서 군림했다. 지금 청와대도 그런 구조일지 모른다.
최영훈 논설위원 tao4@donga.com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구독
트렌드뉴스
-
1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6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7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아파트’로 무대 연 그래미 시상식, ‘골든’으로 혼문 닫았다
-
10
추성훈 “매번 이혼 생각…야노시호와 똑같아”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트렌드뉴스
-
1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6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7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아파트’로 무대 연 그래미 시상식, ‘골든’으로 혼문 닫았다
-
10
추성훈 “매번 이혼 생각…야노시호와 똑같아”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김현수]적자로 34년 버틴 보스턴다이내믹스 생존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02/133284874.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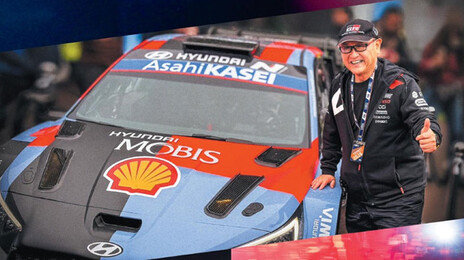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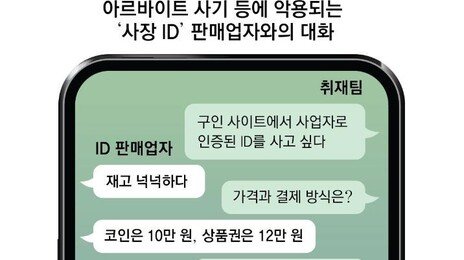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