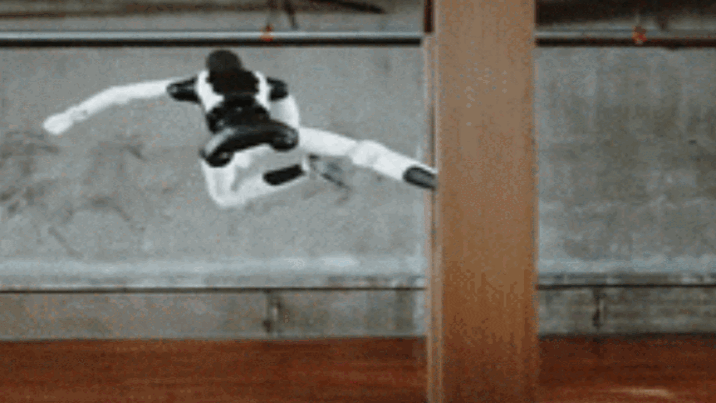공유하기
[문화칼럼]최영미/2009년 4월 캘리포니아
-
입력 2009년 8월 29일 0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구경도 좋지만 며칠간의 단체 일정을 소화한 뒤에 혼자만의 느긋한 시간이 절실했으나 한국 손님들에게 미국을 보여주려는 호의를 거절하기도 뭣해 선뜻 따라나섰다. 시내를 벗어나 파란 바다가 보이자 기분이 가벼워지며 나는 다시 여행자가 되었다. 영화에서 본 듯한 풍경이(샤론 스톤의 ‘원초적 본능’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해안을 따라 펼쳐진 좁은 도로를 1시간쯤 달리자 어느새 나무들이 울창한 숲에 이르렀다. 푸른 수풀 속을 헤치고 들어가니 눈앞에 뭔가 커다란 게 불쑥 솟아 올라 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보는 산, 한국과는 모양이 다른 높은 땅덩이가 산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등산로 입구에 오듀본캐니언의 관리사무실이 버젓이 자리 잡았고, 널따란 공터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자연교육 홍보물을 파는데 마치 축제를 벌이듯 흥겨운 분위기였다.
문학행사후 들른 레이스 곶
미리 와서 우리를 기다리던 로버트 하스 교수를 따라 산을 올라갔다. 나만 편한 운동화를 신고 4명의 다른 시인은 모두 구두를 신었는데 간밤에 무얼 먹었는지 걸음이 처지지 않고 잘도 따라왔다. 정말 한국 아줌마들은 힘이 세다! 조금만 굽이 높아도 기우뚱거려, 4cm가 넘는 높이의 구두는 아예 사지도 않는 나는 그녀들의 용맹함에 놀랄 수밖에. 레이스 곶 일대에서 자라는 희귀한 풀과 나무들이 그려진 종이판을 들고 자연학습을 나온 학생들처럼 우리는 하스 교수가 손으로 가리키는 식물들의 이름을 익혔다. 엄청난 덩치로 나를 위협했던 옻나무가 기억난다. ‘poison oak’라는 이름을 듣자 내 맥박이 뛰었다. 독성이 강한 미국 옻나무에 살갗이 스쳐 죽고 싶지 않았다. 바위틈에서 발견한 산딸기는 어쩜, 어릴 적 세검정의 골짝에 피었던 것처럼 붉고 탐스러웠다.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인 조류 관측소에 도착해 숨을 고르고 땀을 닦았다. 새들이 떼 지어 서식하는 모습을 연상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새’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담?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답이 풀렸다. 렌즈에 잡힌, 저 멀리 나뭇가지 위에 앉은 하얀 해오라기는 죽은 듯 깃털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고 있나? 관광객들이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새들이 놀라지 않게 한참 떨어져 관찰하라고 계곡 건너편에 전망대를 설치한 그네들의 배려, 체계적인 자연보존 의지가 부러웠다. 인간들에게 시달리지 않아서인지, 내가 본 미국의 새들은 살이 통통하고 윤기가 흘렀다.
그 사랑스러운 놈들을 잊지 않으려고, 나의 특별했던 소풍을 기념하려고 해오라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림엽서를 샀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 한 귀퉁이에 뭔가 시커먼 것이 묻어 있다. 어머, 이거 새똥이잖아!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리다, 냉큼 달려가 판매원에게 새똥을 들이대며 깨끗한 엽서로 바꾸었다. 새의 (종이) 이미지 위에 진짜 새가 (우연히) 날아와 배설물을 남기다니. 왜 나한테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지. 내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모아 책을 쓰라고, 친하게 지내던 편집자가 제안한 적도 있다.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 있다면
산을 내려와 조금 달리니 예쁜 상점과 레스토랑이 이어진 작은 타운이 나왔다. 가게에 전시된 물건이 멋스럽고 부티가 흘렀다. 치즈를 직접 만들어 파는 곳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고 갤러리에서 시를 낭송했다. 내가 쓰고 번역한 ‘과일가게에서’를 영어로 읽었다. 마지막 행이 끝나기도 전에 청중으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던 순간이 내겐 천국이었다. 낭송회가 끝나고 우아한 자태의 어느 할머니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네 시에 고맙다(Thank you for your poems)”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내가 시인임을 잊고 사는데, 허울뿐인 시인의 삶을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내가 고마웠다.
돌아오는 길에 태평양의 장엄한 노을을 감상했다. 해안가의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펼쳐진 농염한 구름이 죽고 싶도록 아름다웠다.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아닐까.
최영미 시인
김유준의 재팬무비 >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동아경제 人터뷰
구독
-

동아광장
구독
트렌드뉴스
-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2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4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5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6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7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8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
9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0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7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8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10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트렌드뉴스
-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2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4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5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6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7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8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
9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0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7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8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10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유준의 재팬무비]멋진 캐릭터만 만들면 만사형통](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