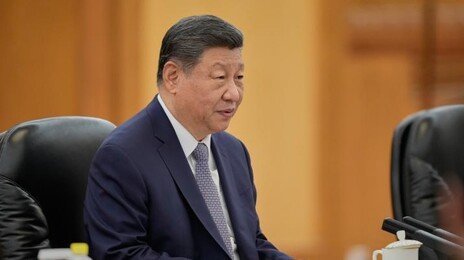공유하기
[광화문에서/박원재]아파트 분양도 경영이다
-
입력 2009년 5월 25일 02시 51분
글자크기 설정

침체의 골이 워낙 깊었던 터라 ‘청라의 대박’은 더욱 값지게 느껴질 것이다.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처지에 고용파급 효과가 큰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어느 경기지표의 호전보다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다고 자축하거나 자랑하기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건설업체가 청약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적절한 가격전략을 세워 거둔 성과인지가 분명치 않다. 늘 해오던 식으로 했을 뿐인데 주변 여건과 우연히 맞아떨어진 결과라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청라지구의 높은 청약 경쟁률에 주목하면서도 그 성공을 흔쾌하게 축하하지 못하는 것은 업계의 체질 개선을 막는 진통제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청라지구 열풍은 구입 후 최장 3년간 전매를 허용하고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기로 한 정부 조치 덕분이다. 800조 원이 넘는 단기유동성 중 상당액이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떠돌다가 분양시장으로 방향을 튼 영향도 컸다.
청라 A29블록에서 호반 베르디움 34평형 2134채를 분양한 호반건설 사례에 눈길이 가는 것은 한국에서도 ‘아파트 분양학’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땅을 사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관된 논리를 적용했다. 해당 용지의 사업성과 전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분양 확률을 따진 뒤 시뮬레이션 결과 초기 분양률이 70%를 넘는 데에만 아파트를 짓고,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미련 없이 사업을 접었다.
청라 A29블록 용지는 본래 다른 업체 소유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우려가 제기된 2007년 말 이 땅이 매물로 나오자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염두에 둔 수요자를 겨냥해 중소형 아파트를 지으면 설령 경기가 나빠져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분양 사태가 유행처럼 번진 작년 9월과 12월 청라지구에서 거뜬히 분양에 성공한 2000여 채의 아파트 용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입했다. 그 대신 분양할 자신이 없는 전주 천안 평택 등지에서는 손을 뗐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77위에 불과한 데도 2000년 이후 분양한 25개 사업장의 계약률이 99%에 이르고 20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것은 부침이 심한 주택시장에서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지방 소형업체뿐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며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메이저 업체 중에도 미분양의 덫에 걸려 고전하는 곳이 많다. 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를 지으면 결국은 팔리더라는 ‘분양 불패(不敗)’ 신화와 작별하지 않으면 경기가 출렁일 때마다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산전수전 겪은 창업자의 ‘감(感)’과 부동산경기 사이클만 잘 타면 된다는 식의 ‘운(運)’에 아파트 분양의 성패를 맡기기에는 한국의 주택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졌다. 청라에서 개가를 올린 업체들은 감과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한 것일까.
박원재 경제부장 parkwj@donga.com
트렌드뉴스
-
1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2
1만명 뒤엉킨 日 ‘알몸 축제’ 사고 속출…3명 의식불명
-
3
교수 지드래곤,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 “정답 없는 세상, 틀려도 괜찮아”
-
4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5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6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7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가능한 적은 금액’ 즉시 인출하세요
-
8
총 들고 트럼프 사저 침입한 20대 사살…백악관 “미친 사람 무력화”
-
9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10
러 바이칼호 ‘빙판 투어’ 버스 침몰…中관광객 8명 사망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3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4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5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5명 이탈도
-
6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7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8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9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10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트렌드뉴스
-
1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2
1만명 뒤엉킨 日 ‘알몸 축제’ 사고 속출…3명 의식불명
-
3
교수 지드래곤,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 “정답 없는 세상, 틀려도 괜찮아”
-
4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5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6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7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가능한 적은 금액’ 즉시 인출하세요
-
8
총 들고 트럼프 사저 침입한 20대 사살…백악관 “미친 사람 무력화”
-
9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10
러 바이칼호 ‘빙판 투어’ 버스 침몰…中관광객 8명 사망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3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4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5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5명 이탈도
-
6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7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8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9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10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승재의 영화이야기]'영화 아카데미'의 빛과 그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