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과 내일/홍찬식]세계적인 대학이 10개 있다면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2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중국은 거의 필사적이다. 중국의 대학들은 문화혁명의 후유증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뼈아픈 기억을 딛고 중국은 1998년 본격적인 대학 재건에 나섰다. 마침 베이징대의 개교 100년이 되는 해였다. 기념식 연단에 오른 장쩌민 당시 총서기는 “우리에게도 세계 수준을 갖춘 약간의 수(數)의 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연설을 신호 삼아 ‘세계 일류 대학 건설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9개 대학을 뽑아 지원을 했다.
각국은 일류 대학 늘리기 전쟁 중
다른 나라 대학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대학이 나오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영국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200대 대학 순위에서 중국은 6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베이징대가 36위, 칭화대가 40위였다. 10년도 되지 않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서울대(51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132위) 2개 대학만이 명단에 올랐다.
과거에 평등주의를 강조했던 나라일수록 ‘세계적인 대학’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무료 대학교육으로 ‘대학생들의 천국’이던 독일은 2002년 새 원칙을 발표했다. ‘독일 교육의 변화와 개혁은 이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대학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으므로 오랜 평등주의 전통을 포기한다는 중대 선언이었다. 그러고는 9개 엘리트 대학을 뽑아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교육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영국은 6월 ‘대학기술부’라는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들었다. 기존 교육부에서 대학 부문을 떼어 내어 중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나라마다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려는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진다.
2003년 독일 정부가 내놓은 ‘국가 어젠다 2010’에는 그 이유가 잘 나와 있다. ‘21세기 들어 국제경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현재에 안주하면 2류 국가로 도태될 수 있다. 특히 교육과 연구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대학을 보유하고 있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교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에게도 세계적인 대학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 본다. 한국 대학 가운데 세계 수준의 대학이 10개쯤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입시 과열이 진정되고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이다. 최고 수준의 대학이 여럿 있으면 미국처럼 입시 경쟁이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유학은 갈 사람만 가게 되므로 감소할 것이다.
교육 문제 해결의 멀지만 가까운 길
대통령 후보들이 다투어 교육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입시와 관련된 것은 넘쳐도 세계적인 대학 육성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은 후보는 별로 없다. 대학 평준화 환상에 빠진 후보마저 있다. 병을 고치는 데 원인 치료가 최고이듯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계적인 대학 육성이 오히려 입시 문제 해결의 빠른 길이다.
우리 국민은 해마다 30조 원의 사교육비를 쓴다. 만약 이 돈의 절반이라도 떼어 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대학이 여럿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대학 키우기에 쓴 돈은 지난 10년간 4조5000억 원에 불과했다.
대학을 나무라기는 쉽다. 하지만 명문대에 냉소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일단 규제로 묶어 놓은 대학의 손발을 풀어 주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질책은 나중에도 늦지 않다. 그것이 21세기의 시대정신이고 국민에게도 남는 장사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씨네@메일 >
-

프리미엄뷰
구독
-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2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3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4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5
이병헌 ‘미모’ 자랑에 美토크쇼 진행자 테이블 치며 폭소
-
6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7
靑 ‘1기 참모진’ 개편 초읽기…정무수석 우상호 후임에 홍익표 유력
-
8
[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
-
9
‘과학고 자퇴’ 영재 백강현 “옥스퍼드 불합격…멈추지 않겠다”
-
10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4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7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8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
9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10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2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3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4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5
이병헌 ‘미모’ 자랑에 美토크쇼 진행자 테이블 치며 폭소
-
6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7
靑 ‘1기 참모진’ 개편 초읽기…정무수석 우상호 후임에 홍익표 유력
-
8
[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
-
9
‘과학고 자퇴’ 영재 백강현 “옥스퍼드 불합격…멈추지 않겠다”
-
10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4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7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8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
9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10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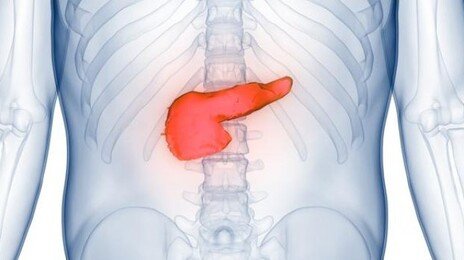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