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고/김용문]‘단일민족’ 집착에 상처받는 외국인 新婦
-
입력 2007년 8월 21일 03시 03분
글자크기 설정

이런 지적이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가 다민족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와 우려가 컸다. 이런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뒤 강원도에서 사는 21세의 한 베트남 여성은 남편에게 여러 차례 구타당하자 이혼을 요구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43세 남편과는 언어 문화 연령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했다. 더구나 남편은 어린 아내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에게서 전화 연락이 오는 것도 싫어했다. 중재로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갈등이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
전남의 한 필리핀 여성은 “음식과 제사 등 한국 농촌 풍습에 익숙해지는 데 어려움이 많아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토로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여성은 “한국말 배우는 데도 벅찬데 아이부터 낳았다.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해 아이가 학습 문제로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결혼이민 가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경우 4쌍 중 1쌍이 국제결혼한 이들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5%인 72만2000명을 헤아린다. 우리도 다문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은 저소득층 내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국내 남성의 상당수는 저소득층, 장애인, 혼기를 넘긴 고령자 등이다. 재혼이 45.3%에 이른다.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자 외국인 신부를 찾는 남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들은 가부장적인 한국가족 문화와 번번이 충돌하고 있다. 농촌에 사는 외국인 신부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빈곤, 사회적 배제 등 농촌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한국에 왔으나 오히려 소외와 가난을 떠안게 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1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국제결혼으로 태어날 아동이 2010년에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세 자녀들은 단일민족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왕따를 당하고 있다. 우리말이 서툰 엄마에게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말과 글이 더뎌서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결혼이민 가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국제결혼 가정과 2세 자녀 현황을 파악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이주 여성 및 2세 혼혈자녀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여성의 결혼 알선 과정 감시 및 이주 여성 교육과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자원을 이주 여성 교육 지원에 활용하고 국제결혼 가족에게 후원가족을 맺어 주는 사업 등을 활성화해서 연극 관람, 유적지 체험 등으로 한국 문화에 충격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2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배런을 전쟁터로”…트럼프 아들 입대 촉구 SNS 확산
-
8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9
오세훈, 국힘 공천 받으려면 ‘1대1 결선’ 거쳐야 할듯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10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2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배런을 전쟁터로”…트럼프 아들 입대 촉구 SNS 확산
-
8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9
오세훈, 국힘 공천 받으려면 ‘1대1 결선’ 거쳐야 할듯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10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중훈의 세상스크린]배우지망생때의 시련](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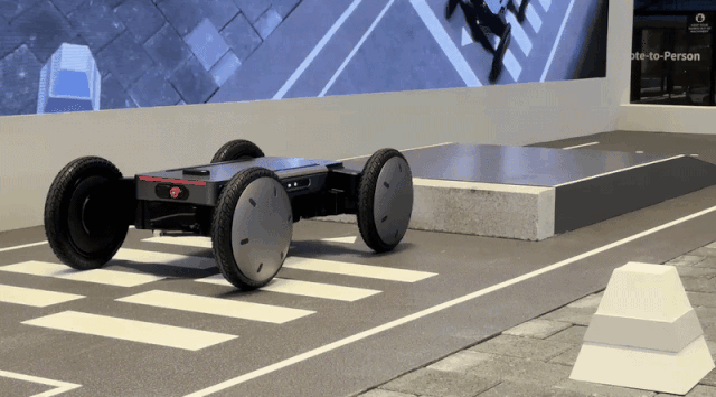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