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고미석]예술이 올림픽이 될 수 없는 까닭은
-
입력 2006년 2월 3일 03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이 시에서 말하듯 3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벌떡 일어서서 집단적인 의식을 치른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을 것이다. 선택의 여지라곤 없이 ‘모두 함께’ 공유를 강요당했던 체험은 또 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워 선생님께 검사받거나, 반 전체가 고래고래 합창하듯 외쳤던 경험.
집단에의 종속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이 같은 풍경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내 삶과 관련된 나만의 결정을 내릴 때도 웬만하면 ‘다수’와 ‘타인의 취향’에 맞추는 게 안전하다는 집단 무의식은 사람들 마음속 깊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외면적 강압이 사라진 새 시대의 민주 시민들이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억압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몰리는 데 대해 사람들은 재산 증식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저마다의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롯이 ‘나의 취향’을 위한 선택인 문화 예술을 즐기는 데 있어서까지 한쪽으로만 쏠리는 광경은 잘 설명이 안 된다.
예술은 등수를 매길 수 없는데도, 우리 사회에선 언제부터인가 책이든 영화든 ‘잘나간다’는 것에만 집착하는 ‘쏠림’과 ‘치우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출판사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집착해 ‘사재기’ 파문을 일으키는 데는 왜곡된 시장 구조의 탓이 크지만 그 언저리에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베스트 순위 안에만 올려놓으면 대중이 따라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박스오피스 히트작이라고 하면 관객들은 그 작품에 우르르 몰려든다. 현대 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독 우리 문화계에는 ‘대박’의 신화 아래, 온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는 예술 작품이 많다.
어느 분야건 온 국민의 취향이 획일적으로 변해 가는 것은 반가울 수 없다. 문화 쪽은 더욱 그렇다. ‘1등’보다 ‘다름’의 가치가 더 소중한 곳이 바로 예술 동네이기 때문이다. 18세에 조국을 떠나 낯선 땅을 유목민처럼 떠돌면서도 강인한 자생력으로 세계 속에 살아남은 한국인, 문화를 통해 세계사에 기여한 백남준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예술을 혼동하고 있어요. 군정(軍政) 때부터 이겨야 한다고 밀어붙였고, 1등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술은 다름이 중요하지, 누가 더 나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로와 피카소는 서로 다른 것이지 누가 더 잘하는 게 아니지요. 다른 것을 맛보는 것이 예술이지 1등을 매기는 것이 예술이 아닌 겁니다.”
‘타인의 취향’에 휩쓸려 ‘나만의 취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회에서 제2, 제3의 백남준이 탄생할 수 있을까. 시대를 짓눌렀던 어둠도 사라진 지금, 우리 모두 그 물음에 대답해야 할 차례다.
고미석 문화부 차장 mskoh119@donga.com
광화문에서 >
-

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송평인 칼럼
구독
트렌드뉴스
-
1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2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3
[단독]“물건 보냈는데 돈 안와”… 국제정세 불안에 수출대금 8000억 떼일 위기
-
4
[단독]정부, 석유화학 이어 배터리 구조조정 시사
-
5
서울 버스,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노사, 임금 2.9% 인상 합의
-
6
택배기사 주5일제 해봤더니…“일감 몰려 더 힘들다”
-
7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8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9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10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7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8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9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10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트렌드뉴스
-
1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2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3
[단독]“물건 보냈는데 돈 안와”… 국제정세 불안에 수출대금 8000억 떼일 위기
-
4
[단독]정부, 석유화학 이어 배터리 구조조정 시사
-
5
서울 버스,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노사, 임금 2.9% 인상 합의
-
6
택배기사 주5일제 해봤더니…“일감 몰려 더 힘들다”
-
7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8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9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10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7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8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9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10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하정민]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에 빌미 준 덴마크의 과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4/13315975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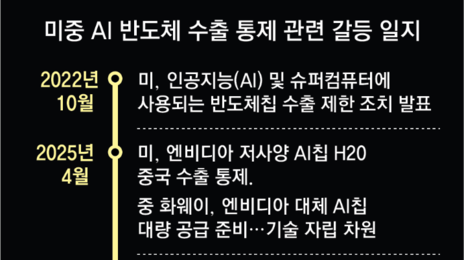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