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책갈피 속의 오늘]1983년 명성그룹 본격 세무조사
-
입력 2004년 6월 14일 18시 44분
글자크기 설정

1983년 7월 31일 아침. 국세청은 발칵 뒤집혔다. 이 날짜 주요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성명광고’는 국세청을 겨누고 있었다.
‘강호제현(江湖諸賢)께 알리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성명은 1983년 6월 15일부터 한달 보름간 계속된 세무사찰로 명성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사요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김모 대리가 수기(手記)통장을 발급해주고 사채를 조달해 김철호 명성회장에게 건네준 사실이 포착됐다. 이듬해 김씨는 15년형을 선고받는다.
이 땅에 ‘콘도미니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여왔던 명성. 그 ‘레저업계의 기린아’는 이렇게 몰락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사활을 걸었다. 소문은 ‘자욱했으나’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는 명성의 돈줄과 무관하다고 확인된 터였다. “이미 ‘뇌관’은 제거됐다!”
예나 지금이나 국세청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국세청 직원들은 기업의 회계장부를 영치해 조사하는 것을 ‘염(殮)’이라고 부른다. 기업의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산채로 수의(壽衣)를 입히는 것이었다.
신선호, 이창우, 권철현, 이철희·장영자, 김철호, 양정모….
1970, 80년대에는 대형경제사건에 발목이 잡혀 스러진 재계의 별들이 많았다. 혜성처럼 나타났다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사범’으로 숙정(?)되는 과정에는 억울한 죽음도 없지 않았다.
1993년 헌법재판소는 “5공 정부의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미 공중분해 된 기업을 어찌할 건가.
정권은 친인척 문제에 관한 한 통치권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고 숱한 루머를 뿌렸다.
5공 초기 철퇴를 맞았던 이·장 부부. 이들은 2000년 ‘구권(舊券) 화폐사건’ 때는 “DJ를 팔았다”는 낭설에 시달렸다. DJ와 ‘집안의 연(緣)’은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였는데도.
울혈이 맺혔던 김씨의 항변은 쩌렁쩌렁하다.
“호남기업 명성은 5공의 희생양이었다. 사건이 친인척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멀쩡한 흑자기업을 ‘생체해부’했다!”
이기우기자 keywoo@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딥다이브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카드뉴스
구독
트렌드뉴스
-
1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2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
3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女 “약물 투약후 운전했다” 인정
-
4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125억 테이블에 쫙…“센 만큼 가져가라” 통큰 성과급 쏜 中회사
-
7
“강아지 뒤 배경 지워줘” 하자… 5초만에 깔끔한 사진 변신
-
8
피부진정 알로에의 숨은 능력…뇌 ‘치매 효소’ 잡는 단서 발견 [노화설계]
-
9
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
10
85세 강부자, 건강한 근황 “술 안 끊었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4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5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6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7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트렌드뉴스
-
1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2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
3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女 “약물 투약후 운전했다” 인정
-
4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125억 테이블에 쫙…“센 만큼 가져가라” 통큰 성과급 쏜 中회사
-
7
“강아지 뒤 배경 지워줘” 하자… 5초만에 깔끔한 사진 변신
-
8
피부진정 알로에의 숨은 능력…뇌 ‘치매 효소’ 잡는 단서 발견 [노화설계]
-
9
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
10
85세 강부자, 건강한 근황 “술 안 끊었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4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5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6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7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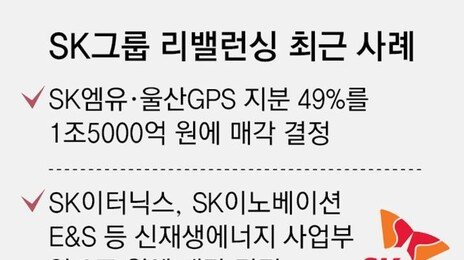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