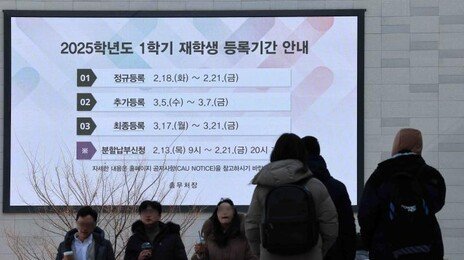공유하기
[오늘과 내일]예술 그 「부피」와 깊이
-
입력 1997년 6월 24일 19시 52분
글자크기 설정
씨네@메일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국방 이야기
구독
-

비즈워치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