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苦에 친구도 없어 텅 빈 農心… 약 타러 가려면 왕복 6시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6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마음의 감기’ 우울증 이기자]<上>우울증 깊어가는 농어촌 노인들

대낮인데도 볕이 잘 들지 않는 단칸방에 모로 누워 있던 이모 씨(83·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지금 누가 문 두드리지 않았소?” 하지만 2일 오후 이 씨가 사는 충남의 한 농촌 마을은 적막했다. 4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몸이 된 뒤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 씨는 가끔 환청을 겪지만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한층 더 우울해진다. 이 씨는 “누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했다.
○ 우울 증세 보이면 병원 진료 대신 굿판
한국인의 조기 사망 원인 2위는 자살이다. 간암 폐암보다 순위가 높다. 자살자 10명 중 6명이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비춰 보면 한국에선 우울증이 웬만한 암보다 더 치명적인 질병인 셈이다. 2010년 51만 명이었던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12년 58만 명을 넘은 뒤 지난해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했다.
우울증 환자의 비율은 이 씨가 사는 충남처럼 만성질환과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이 많은 농어촌에서 특히 높았다. △대화 상대가 적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신이 치료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데다 △어려운 형편 탓에 선뜻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결심해도 정신건강의학과를 갖춘 병·의원이 너무 멀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정신건강의학과 무의촌’ 전국 44곳
농어촌 중엔 진료를 받아 보고 싶어도 주변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없어 환자들이 우울증 증세를 키우는 곳이 적지 않다. 충남의 한 지역에 사는 박모 씨(70·여)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대전까지 가야 한다. 왕복 6시간 넘게 걸리지만 읍내에 딱 한 군데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까진 대중교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지만 이곳은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없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1882명이었지만 정신건강의학과를 갖춘 병·의원이 1곳에 불과했다. 정신건강의학과 1곳당 돌봐야 하는 우울증 환자가 1000명이 넘는 기초단체는 경기 파주시, 부산 기장군, 충남 예산군 등 19곳이나 됐다.
2014년 자살자 1만3836명의 주소지와 정신건강의학과 1407곳의 분포를 분석해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가장 많았던 기초단체 20곳 중 14곳은 정신건강의학과가 한 곳도 없는 ‘무의촌’이었다. 이처럼 정신건강의학과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총 44곳이다. 이곳에 사는 우울증 환자 2만3854명은 우울증 약을 한 번 처방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 주변 시군구까지 가야 했다는 뜻이다. 이들 44곳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평균 36.2명으로 전국 평균(27.3명)보다 높았고, 이 중 41곳(93.2%)은 5년 새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평균 44% 늘었다.
○ ‘마음 주치의’ 정책은 무산 위기
충남지역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나마 지방자치단체가 홀몸노인 등을 방문해 우울증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숨어 있는 환자를 찾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영문 전 국립공주병원장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울증 검사를 해보면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직설적인 표현을 꺼리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충남 특유의 문화가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지자체의 노력으로 개선의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농어촌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올해 초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역에서 ‘정신 보건소’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224곳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마음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산=김호경 kimhk@donga.com·조건희 기자
강도형 서울대병원 교수, 나해란 서울성모병원 교수, 박종일 전북대병원 교수, 이동우 상계백병원 교수, 이영문 전 국립공주병원장, 이준영 서울대 보라매병원 교수,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교수, 한창수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 홍순상 한음한방신경정신과 원장,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이상 정신건강의학과), 김윤태 고려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이상 사회학과)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7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8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9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7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7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8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9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7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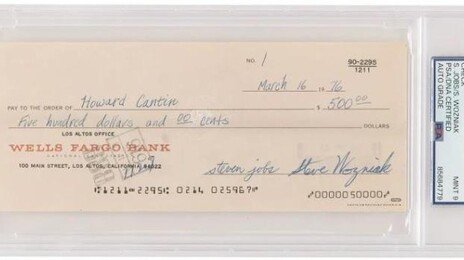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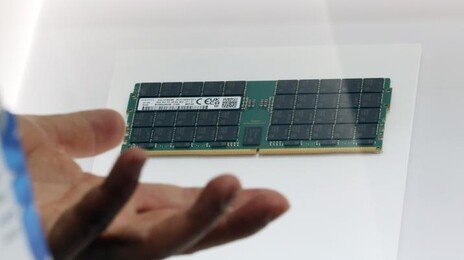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