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아광장/임채청 칼럼]‘당신들은 길을 잘못 들었다’
-
입력 2004년 7월 13일 18시 29분
글자크기 설정

진보 진영이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한 오늘, 그 말이 엉뚱하게 역용(逆用)되고 있다. 청와대가 비판 언론을 향해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고 호통을 치는 현실이 착란을 일으킨다. 권력을 쥐었으니 굿판도 뒤집자는 것일까. 아니면 정월 보름날 “내 더위 네 더위”하듯이 해묵은 아픔을 비판 언론에 떠넘기려는 것일까.
▼당신들만 모르는 당신들의 잘못▼
주객을 바꿔 “청와대는 반(反) 언론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고 해야 시세(時勢)에 부합하는 말이 된다. 13년 전 김 시인은 또 “당신들은 잘못 들어서고 있다, 그것도 크게”라고 외쳤는데 이는 그대로 현 집권세력에 되들려 줘도 무방할 것 같다.
그들 자신만 모르는 집권세력의 잘못을 짚다 보면 알몸으로 행차하는 우스꽝스러운 임금님의 우화가 떠오른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소리가 처음엔 외롭지만 그게 곧 함성이 되는 이치도 되새기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왜 길을 잘못 들었을까.
첫째, 미숙(未熟). 비이성적인 저주와 논리적인 비판, 반대와 지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걸핏하면 막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를 내걸고 주먹을 불끈 쥐는 성마른 행태도 성숙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편협(偏狹). 모두 생각이 같다면 언론자유는 의미가 없다. 로자 룩셈부르크도 “언론자유는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유”라고 했다. 보수 언론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아무래도 언론자유에 대한 소양 부족인 듯싶다.
셋째, 망각(忘却). 기본적으로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경직된 언론관을 용납하기 어렵다. 민주화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언론자유 경시는 민주화에 대한 배반이다. 권력에 눈이 가려 대의를 잊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넷째, 퇴영(退영).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1970년대와 지금은 상황이 판이한데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 드나. 현재의 문제에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콤플렉스 아니면 편의적 발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왜곡(歪曲). 청와대가 다른 언론매체의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일절 눈을 감고 동아 조선에 대해서만 눈을 부릅뜬 것은 공정치 못하다. 그게 두 신문과만 싸울 테니 다른 매체들은 침묵하거나 자기편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은근한 사인이라면 부도덕하기도 하다.
여섯째, 중상(中傷). 최악의 잘못은 허위에 의한 모략이다. 1970년대엔 동아일보가 수도 이전을 낯부끄러울 정도로 적극 지지했다는 청와대의 비난은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본보 13일자 A5면에 그 실상이 잘 정리돼 있다.
일곱째, 저의(底意). 청와대가 어찌 그러는지 다 안다. 안팎으로 뭐가 단단히 꼬이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트릭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쨌든 확실한 전선이 형성되자 여권 관계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그 밖에도 잘못을 꼽자면 많지만 이제 파장을 점검해 볼 때가 됐다. 복잡하게 따져 볼 것도 없다. 청와대의 주도로 여권이 다시 정치게임에 돌입함으로써 결국 흔들리는 것은 나라살림이고 상처 입는 것은 국민이지 않겠는가.
▼게임의 희생자는 나라와 국민▼
처방은 하나뿐이다. 청와대 스스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장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다.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만 사실과 달라도 주저없이 중재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내 온 청와대이므로 그리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임채청 편집국 부국장 cclim@donga.com
동아광장 >
-

광화문에서
구독
-

염복규의 경성, 서울의 기원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3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4
담배 냄새에 찡그렸다고…버스정류장서 여성 무차별 폭행
-
5
“김건희, 싸가지”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무죄 근거 됐다
-
6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7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8
머스크 “전기차 생산라인 빼내 로봇 만든다”…테슬라 모델S·X 단종
-
9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10
‘김정숙 옷값’ 檢 요청에 재수사…경찰 재차 “무혐의”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9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10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트렌드뉴스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3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4
담배 냄새에 찡그렸다고…버스정류장서 여성 무차별 폭행
-
5
“김건희, 싸가지”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무죄 근거 됐다
-
6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7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8
머스크 “전기차 생산라인 빼내 로봇 만든다”…테슬라 모델S·X 단종
-
9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10
‘김정숙 옷값’ 檢 요청에 재수사…경찰 재차 “무혐의”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9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10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정원수]‘9.99 대통령’과 너무 다른 ‘與 검찰개혁 조급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2/13321458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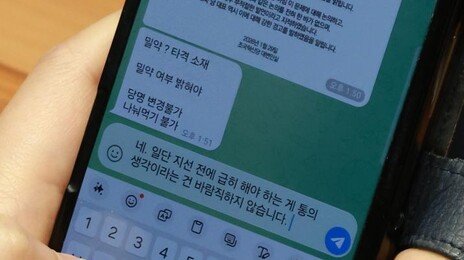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