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이진영]저커버그가 되고 싶다고?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미국 팰러앨토의 투자자와 만나는 술자리에서 그는 혼자 스프라이트를 마셨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스무 살 청년이었을 뿐이다.
티셔츠에 아디다스 슬리퍼를 끌고 다니던 괴짜 대학생이 아이디어 하나로 정보기술(IT)계의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내고 최연소 억만장자가 된 이야기는 드라마틱하다. 아니나 다를까 마크 저커버그(27)의 페이스북 성공 비화를 다룬 영화 ‘소셜네트워크’는 골든글로브 4관왕을 차지했다.
그러니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방해나 말라”며 오히려 욕먹은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억울할 만도 하다. 대통령의 저커버그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업계에선 ‘저커버그가 한국에서 못 나오는 이유’에 대해 말들이 있었다. 대부분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답답한 규제 환경을 꼬집는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성공이 돈을 부를 때 페이스북은 좋은 투자자를 만났다. 이들은 사이트의 운영이나 기업 문화엔 손대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여전히 아디다스 슬리퍼를 신었고, 명함엔 ‘사장입니다…제길’이라고 써서 다녔다. 싸이월드는 달랐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됐고, 벤처를 이끌던 핵심 인력들이 하나 둘 떠났으며, 대기업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빈 자리를 채웠고, 페이스북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됐다.
미국의 경쟁자 마이스페이스가 2005년 5억8000만 달러에 뉴스코퍼레이션에 인수됐을 때도 저커버그는 웃었다. 대기업이 마이스페이스를 망쳐놓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과연 골드만삭스는 최근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를 500억 달러로 평가했고, 마이스페이스는 전체 직원의 절반 수준인 5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단기 수익만 좇는 대기업과 문화적 충돌을 겪다 추락했다, 뉴스코프의 유산을 청산하지 않는 한 가망이 없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투자자를 잘 만나서’라는 해석은 뒤집어 보면 ‘투자자를 잘 골라서’가 된다. 치고 빠지기 식 투자 행태에 휘둘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 저커버그 본인에게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스무 살의 저커버그는 가족이 다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하는 워싱턴포스트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훗날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며 이렇게 털어놓았다. “실리콘밸리식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다. 벤처투자사의 돈을 받고 상장하거나 빨리 회사를 팔아버리거나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을 데려다 앉히는 통속적인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이진영 문화부 차장 ecolee@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알쓸톡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6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7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10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6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7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10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박훈상]국면전환용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실패한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6/133175691.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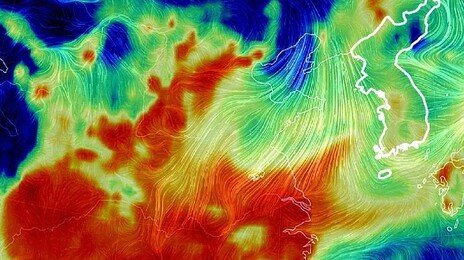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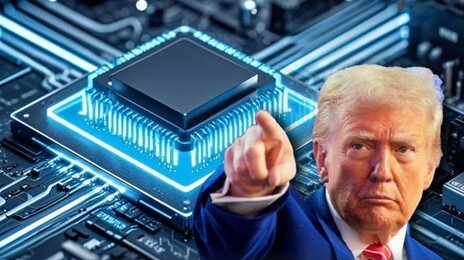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