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과 내일/홍권희]전기자동차 죽이기
- 동아닷컴
-
입력 2009년 10월 19일 17시 29분
글자크기 설정

미국 GM은 지난 20년간 전기자동차 세 종류를 개발 후 폐기했다. 1990년 GM의 협력업체가 만든 ‘임팩트’는 1994년 소비자 시험운행에 1∼2주 투입됐다. GM 이름이 붙은 첫 전기자동차 EV1은 1996년 ‘젠1(1세대)’, 1999년 ‘젠2(2세대)’로 점차 개량돼 희망자에게 2년간 임대됐다.
GM은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와는 달리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대기보전국(CARB)의 무공해차(ZEV) 보급 규제를 연기 또는 폐지해 달라는 소송을 2002년에 냈다. CARB의 규제는 자동차 매연으로 골치를 썩이던 캘리포니아 주가 임팩트에 반해 미국의 7대 자동차 메이커가 무공해차 비중을 1998년 2%, 2001년 5%, 2003년 10%까지 높이도록 한 것이었다.
2003년 말 당시 릭 왜거너 GM 회장은 EV1 프로젝트를 공식 취소했다. GM은 “이익을 낼 만큼 전기자동차를 팔 수 없을 것 같다”고 발표하면서 스스로 ‘EV1은 실패작’이라고 떠벌렸다. 시험운행에 쓰인 임팩트 50대를 박살낸 경험이 있는 GM은 EV1 수백 대를 회수해 압착기로 납작하게 눌러버렸다. 일부만이 ‘길에 나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조건 아래 박물관이나 학교에 보내졌다. 덩달아 CARB의 규제도 시행 유보, 완화, 타협의 길을 걷는다.
전기자동차 개발의 선두에 섰던 GM은 왜 스스로 도끼질을 했을까. 이를 밝혀줄 내부문서 등 증거물은 공개된 게 없다. 크리스 페인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나(Who killed the electric car?·2006년)’에는 찌그러진 EV1이 켜켜이 쌓여 있는 장면과 연구개발진 등의 의혹 제기 증언이 나온다. 지구환경을 구할 획기적 발명품인 전기자동차가 미국 석유업체와 정부, 심지어 자동차메이커들까지 결탁한 검은 커넥션에 희생됐다는 암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자동차 양산(量産)을 2011년으로 2년 앞당기는 등 청사진을 내놓았다. 과거 GM이 한계를 느꼈던 배터리 분야에서 LG와 SK 등이 세계 수위권이어서 국내 업계가 도전해볼 만하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현재의 시장지위를 더 누리고 싶어 전기자동차 조기 도입에 부정적이라면 GM처럼 비싼 수업료를 치를 수 있다. 외국 업체들이 그 공백을 구경만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선두권에서 약간 밀려 있는 각국 자동차메이커들은 전기전자 업체와 손잡고 추월과 역전을 꿈꾼다. 기름이나 엔진자동차 또는 특정 부품을 더 오래 팔아먹기 위한 전기자동차 죽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월요 초대석
구독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트렌드뉴스
-
1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4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5
한그릇 1만5000원 봄동비빔밥 ‘품절’…제2의 두쫀쿠?[요즘소비]
-
6
이란 공습 美 극과극 찬반시위…백악관 800m 거리서 대치
-
7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8
“딱 이틀 오트밀만 먹었더니”…나쁜 콜레스테롤 10% ‘뚝’, 비결은 [바디플랜]
-
9
이란 보복에 7성급 호텔 불길-공항 파괴…테헤란은 축제 분위기
-
10
“‘표심’ 따라 이란 친 트럼프…지독하게 변덕스럽지만 치밀해” [트럼피디아] 〈60〉
-
1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2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3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8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9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10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트렌드뉴스
-
1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4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5
한그릇 1만5000원 봄동비빔밥 ‘품절’…제2의 두쫀쿠?[요즘소비]
-
6
이란 공습 美 극과극 찬반시위…백악관 800m 거리서 대치
-
7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8
“딱 이틀 오트밀만 먹었더니”…나쁜 콜레스테롤 10% ‘뚝’, 비결은 [바디플랜]
-
9
이란 보복에 7성급 호텔 불길-공항 파괴…테헤란은 축제 분위기
-
10
“‘표심’ 따라 이란 친 트럼프…지독하게 변덕스럽지만 치밀해” [트럼피디아] 〈60〉
-
1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2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3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8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9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10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한애란]서울을 비우려면 재택근무가 답이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7/13344019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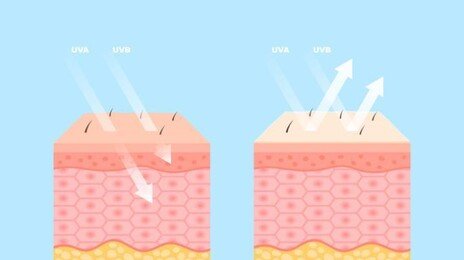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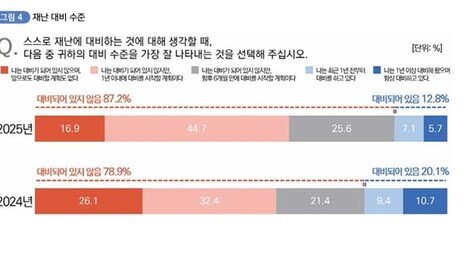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