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질병도 국경 넘나드는 시대
얼마 전 지진과 해일로 발생한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또한 지구촌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로 떨게 했다. 자연재해와 ‘기술재해’가 겹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류 최악의 상황을 맛보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것도 일본산 어패류, 육류, 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들에 대한 오염의 공포를 불러왔다.
지구촌의 식품 공포와 전염병 확산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올해 외국을 여행하는 세계 인구는 1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구촌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한 해에 한 번 이상 외국을 여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을 비롯한 상품의 이동은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하다. 사람과 식품의 국제 이동이 이렇게 활발하다 보니 온갖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질병 바이러스의 변이와 박테리아의 변종을 확산시킬 것이고, 새로운 전염병을 끊임없이 탄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질병 보도는 과학적 사실을 쉽게 넘어선다.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판매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그 문제들에 대해 보도하는 뉴스를 구매함으로써 보다 잘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뉴미디어들이 출현하면서 그런 ‘문제 팔기’는 훨씬 용이해졌고 경쟁 또한 치열해졌다. 모든 문젯거리가 선정주의의 대상이 되었다고나 할까. 슈퍼박테리아의 유럽 출현, 일본의 방사능 오염, 구제역 확산 등이 과학기술적 문제를 벗어나 ‘사회경제적 공포’로 곧바로 변질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행을 줄이고, 미디어 경쟁을 제한할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과학계의 리더십이다. 인류의 문제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과학계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세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 못지않게 과학기술적 세계 문제에 초점을 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기구가 문제 해결에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연구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청, 과학기술한림원 등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한 명도 없는, 국제식품규격(Codex)이 인증하고 있는 감마선 이용 식품위생관리를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즉각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즉 과학기술계의 리더십 부족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나아가 세계 시민이 불필요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김학수 서강대 교수 과학커뮤니케이션
시론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시론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軍 무력화하는 낮은 성인지감수성[시론/민무숙]](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1/06/07/107297370.1.jpg)
![군사의제 빠진 쿼드 참여 고려해야[시론/김현욱]](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1/03/22/106006940.1.jpg)
![국제사회 입지 좁히는 인권 침묵[시론/박원곤]](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1/03/09/10579552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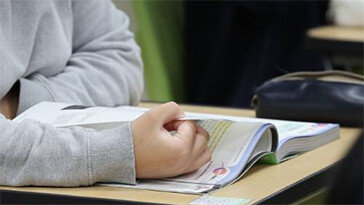
![“뇌경색 후유증, 운동으로 극복… 제2의 인생 즐긴다”[병을 이겨내는 사람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5450764.1.thumb.jpg)
![[셀프건강진단]암슬러 격자의 직선이 휘거나 끊어져 보인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5459259.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