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왕이 마침 곁에 있는 장량에게 물었다. 장량이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함부로 항왕과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아직 제왕(齊王) 한신과 상국 팽월의 군사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번쾌가 다시 우기고 나섰다.
“항우가 흉악하나 이미 막다른 골짜기로 몰리는 짐승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만 계시면 언제 때려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하물며 천하의 맹장인 항왕이겠습니까? 막다른 골짜기로 몰리고 있기에 오히려 항왕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장량이 한 번 더 그렇게 말렸으나 한왕의 마음은 이미 번쾌 쪽으로 기운 뒤였다.
“하지만 여기까지 따라와 눈앞에 적을 두고 물러날 수는 없지 않은가? 전군을 들어 항왕과 결판을 내는 것도 아니니, 한번 부딪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성싶다. 번 장군은 정병 1만을 이끌고 양하 현을 들이치되 뜻과 같지 않거든 얼른 군사를 물리도록 하라.”
그리고 번쾌에게 군사 1만을 갈라 주었다. 장량도 그런 한왕을 더는 말리지 못했다.
“정히 그러시다면 본진이라도 굳게 단속하시어 만일을 대비하십시오. 항왕이 앞장선 초나라 대군의 돌진을 막아낸 군대는 아직까지 아무데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세 좋게 달려 나가는 번쾌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장량의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였다.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번쾌가 보낸 군사가 달려와 알렸다.
“번 장군이 양하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성을 지키던 초나라 장수 주동(周동)과 군사 4000을 사로잡고 대왕께서 이르시기를 기다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왕은 한창 진채를 얽던 대군을 거두어 양하로 달려갔다. 가보니 정말로 들은 대로였다. 항복한 장수가 변변찮고 사로잡힌 군사들이 한결같이 노약한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번쾌가 힘들여 싸워서 성을 뺏은 것만은 틀림없었다. 한왕이 주동을 장수로 거두어들이고 물었다.
“항왕은 어디로 갔는가?”
“전군을 이끌고 고릉 북쪽으로 갔습니다.”
주동이 전날 들은 대로 대답했다. 한왕이 알 수 없다는 눈길로 물었다.
“항왕은 어찌하여 동쪽 팽성으로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서쪽 고릉으로 갔단 말이냐?”
“그것은 신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장졸을 그리로 몰아갔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마침 한왕 곁에 있던 진평이 까닭 모르게 굳은 얼굴로 주동을 바라보며 물었다.
“항왕은 여기서 바로 고릉으로 갔소? 아니면 군사를 멈추고 이것저것 살피다가 땅을 골라 그쪽으로 갔소?”
“한나절 몸소 기마대를 이끌고 여기저기 살피다가 고릉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도 주동은 보고 들은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진평이 문득 한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왕, 이는 마음먹고 되받아칠 작정이란 뜻입니다. 항왕이 미리 쳐놓은 그물로 뛰어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글 이문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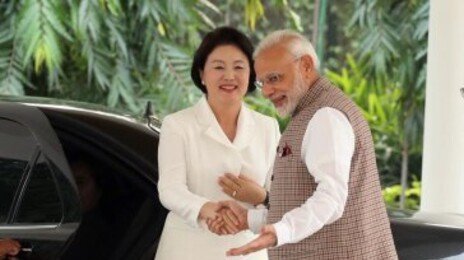
-

LH 등 지방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일부 부담키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七. 烏江의 슬픈 노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