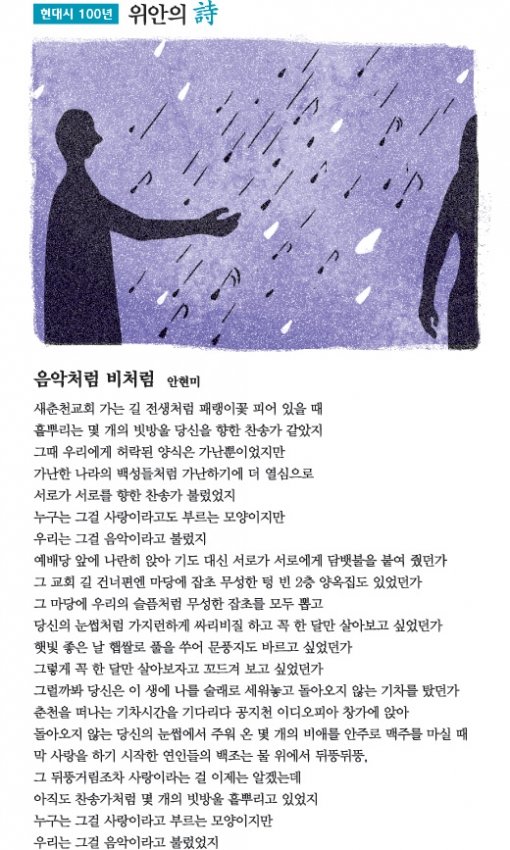
음악이 사랑과 가장 닮아 있을 때는 사람이 그 음악 안에서 가장 가난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그 음악으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때, 그 음악 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보내곤 했을 순간의 일입니다. 사람이 가난한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과 가장 닮아 있는 음악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술래가 되어 그 어리둥절함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 같은 그 경험이 그를 사랑이라는 가난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춘천교회를 지나다가 문득 아련한 물방울들이 서걱거리는 이 시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시인의 추억인지, 시인이 본 추억인지 시 속엔 가난한 연인이 등장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텅 빈 2층 양옥집이 보이고 예배당 앞에 나란히 앉아 서로 담뱃불을 붙여주는 연인이 보입니다. 시인은 언젠가 그 깨끗한 양옥집에 들어가 꼭 한 달만 살아보자고 연인을 꼬드겨 보고 싶었나 봅니다. 꼬드긴다는 말이 주는 여운이 이토록 아름다운 비애를 자랑하는 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만…같이…살아보자고…꼬드겨 보고 싶다는 생각, 우리도 누군가의 속눈썹을 훔쳐보며 마음속에 중얼거려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중얼거리는 일도 사랑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인은 가난한 사랑 후에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된 사랑과 음악의 양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한없이 뒤뚱거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 뒤뚱거림조차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네.”
김경주 시인
환자곁에서
구독-

출산율, 다시 ‘1.0대’로
구독
-

정용관 칼럼
구독
-

여주엽의 운동처방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정부,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에 최고 160억원 준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2027년 우리당 대통령 탄생 노력”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로맨스 스캠에 20년 모은 전재산 날려”…가상자산 투자사기 경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환자곁에서]"보채는 게 반가워요"](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