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의약분업 5년]<하>환자에게 권리를
-
입력 2005년 6월 29일 03시 16분
글자크기 설정

‘대한민국 중년들이여 단단함을 지키자’란 문구와 함께 근육질 남성의 팔뚝이 클로즈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단함을 지키자’는 표현을 이 회사 발기부전 치료제의 간접광고로 해석했다. 제약사는 바로 광고를 내려야 했다. 이 약은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이 해프닝은 의약분업하에서 의사와 약사 간 영역 다툼 속에 실종된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환자도 알 권리가 있다”=의약분업과 함께 의사와 약사 진영은 약품명 처방이냐, 성분명 처방이냐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의사는 현재와 같은 약품명 처방을, 약사는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
이들 모두 ‘환자와 소비자를 위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도 환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돼 있지 않다.
2003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59.5%가 “처방되는 약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이 약 정보를 소비자의 알 권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권리는 충족되지 않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약사로부터 약 정보를 얻기 어렵다’(30.8%)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본보 설문조사에서는 42.6%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여러 종류의 약을 제시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많은 병원이 이런 방식을 택한다. 의사가 같은 성분의 약 여러 종류를 환자에게 제시하면 환자가 약을 고른다. 2002년 미국의 ‘예방(Prevention)’지의 조사에서 환자의 50%가 “의사와 상담한 후 원하는 약을 처방받았다”고 응답했다.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논의해야”=많은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미국처럼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 정보를 많이 알면 그만큼 현명한 소비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
200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조사 결과 환자의 43%가 광고에서 약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61%는 부작용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광고에 위험과 부작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송재찬(宋在燦) 과장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과 관련해 “약을 좋아하는 한국 풍토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李儀卿) 보건연구실장은 “약품 오남용이 크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환자의 불만 증가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日 교과서 왜곡 :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 :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절차 >
-

정경아의 퇴직생활백서
구독
-

주성하의 ‘北토크’
구독
-

횡설수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6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7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8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9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10
역대급 불황이라고? 실상은 자산 계층 중심으로 소비 확산하는 국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트렌드뉴스
-
1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6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7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8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9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10
역대급 불황이라고? 실상은 자산 계층 중심으로 소비 확산하는 국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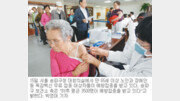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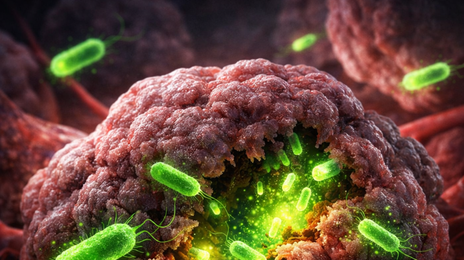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