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규(1977∼ )
물고기가 처음 수면 위로 튀어오른 여름
여름 옥수수밭으로 쏟아지는 빗방울
빗방울을 맞으며 김을 매는 어머니
어머니를 태우고 밤길을 달리는 버스
버스에서 졸고 있는 어린 손잡이
손잡이에 매달려 간신히 흔들리는 누나의 노래
노래가 소용돌이치며 흘러다니는 개울가
개울가에서 혼자 물고기를 파묻는 소년
소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버지
아버지가 버스에 태워 보낸 도시의 가을
가을마다 고층빌딩이 쏟아내는 매연
매연 속에서 점점 엉겨가는 골목
골목에서 여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손가락
손가락이 밤마다 기다리는 볼펜
볼펜이 풀지 못한 가족들의 숙제
숙제를 미루고 달아나는 하늘
하늘 쪽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마을
마을에서 가장 배고픈 유리창
유리창에서 병 조각처럼 깨지는 불빛
불빛 속에서 물고기처럼 우는 사내
사내가 부숴버린 어항이 조각조각 널린 방바닥
방바닥에서 퍼덕거리다 죽어가는 물고기
한 사내가 제 삶이 지나온 자취를 끝말잇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회상으로 되돌아본다. 시작은 ‘물고기가 처음 수면으로 튀어오른 여름’, 싱그럽고 서정적인 여름의 탄생이다. ‘여름 옥수수 밭으로 쏟아지는 빗방울’ 속에서 이 무구한 물고기의 눈에 맺힌 처음 풍경은 비를 맞으며 김을 매는 어머니. 어머니는 빗속에서 김을 매다 아기를 낳으신 걸까. 그 어머니, 아직 철없는 딸만 데리고 먼저 도시로 떠난다. 보퉁이 몇 개 들고 ‘밤길을 달리는 버스’를 타고. ‘마을에서 가장 배고픈 유리창’인 농촌 가정의 도시 유입 행색이다. 사내가 엄마와 누나한테 보내지는 계절은 가을인데, 이후로 사내의 삶은 도시의 가을, ‘가을마다 고층빌딩이 쏟아내는 매연/매연 속에서 점점 엉켜가는 골목’이다. 거기서 사내는 밤마다 시를 쓴다. 그런데 ‘볼펜이 풀지 못한 가족들의 숙제/숙제를 미루고 달아나는 하늘’, 속수무책 가난에 들볶일 때면 술을 마시고, 빈 술병을 내리치며 ‘물고기처럼’ 우는 사내다. 시 제목이 ‘끝말잇기’가 아니고 ‘끝말 잊기’다. ‘방바닥에서 퍼덕거리다 죽어가는 물고기’, 이 끝말을 부디 잊어달란다. 이렇게 맺으려던 게 아니었다고.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사설
구독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LA서 한인 남성 사살’ 연루 美 경관 신원 특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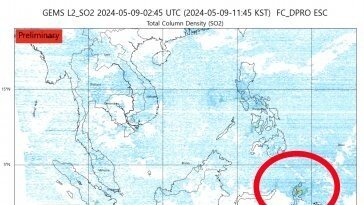
인니 화산 폭발…韓, ‘기후변화 정찰대’로 실시간 확인했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경비원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 인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물 끝](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4/07/28/65461314.1.jpg)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끝말 잊기](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4/07/25/65424334.2.jpg)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커다란 나무](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4/07/23/65379871.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