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 대통령’ 벤 버냉키, 소방수 될까
-
입력 2007년 8월 13일 03시 03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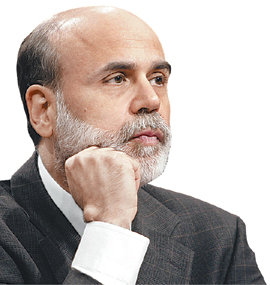
금리인하 놓고 “시장 안정” “인플레 우려” 고민
미국에서 ‘금융 대통령’으로 통하는 벤 버냉키(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금융위기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임기 14년 가운데 고작 1년 반을 소화한 버냉키 의장은 9, 10일 62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긴급 자금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다. 9·11테러 직후 혼란기였던 2001년 9월 이후로는 최대 규모다.
▽금리를 낮춰서라도?=FRB는 10일 성명에서 “연방기금금리가 목표선인 5.25%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시장에서 연방기금금리는 전날보다 조금 떨어진 5.375% 선에서 형성됐다.
월스트리트나 미국 언론은 모두 FRB의 긴급자금지원 결정을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부자’로서 교과서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이유다.
관건은 FRB의 조치가 2차 수단인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다.
부동산 붐이 일었던 2000년 전후에 미국 저소득층은 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샀다. 신용이 낮은 탓에 일반인 대출금리(연 6%)에 가산금리를 얹은 평균 9%대의 이자가 매겨졌다. 그러나 경기 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랐고, 부동산 버블 걱정이 커지면서 신규 주택 구입자가 줄어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결국 ‘상투를 잡은’ 주택 구매자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자금의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이런 불량대출채권은 결국 ‘서브프라임 대출위기’를 불렀다. 문제의 대출이 전체 주택대출액의 1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일부 금융전문가는 금리 인하는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가 집을 빼앗기지 않고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이 이런 결정을 손쉽게 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프린스턴대 교수 시절 ‘1930년대 미국 공황론’을 집중 연구한 버냉키 의장은 당시 “중앙은행의 단기 유동성 공급 실패가 공황을 불렀다”는 분석을 자주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글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는 해법이 된다는 분석은 보이지 않았다”고 11일 보도했다.
버냉키 의장이 이끈 FRB가 “금리를 낮추면 경기 과열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며 5.25%라는 기준금리를 1년 넘도록 유지해 온 점도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도덕률 논란=논란의 또 다른 한 축은 서브프라임 위기의 피해자가 누구냐는 점이다. 미 중서부 지역 주택자금 대출업체에서 시작된 위기는 중소규모 대출업체→월가 금융사→헤지펀드→대형 연기금 기관투자가라는 연결고리를 타고 번져나갔다.
미국 금융권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도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씨티그룹은 최근 몇 주 동안 신용사업에서 5억 달러의 손실을, 골드만삭스의 최대 헤지펀드인 글로벌 알파 헤지펀드도 26%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장자인 증권사 브로커나 억만장자인 헤지펀드 매니저의 손실을 막기 위해 FRB가 나서야만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도 11일 사설에서 “무모하게 돈을 빌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 FRB가 구제금융을 한다면 ‘잘못된 결정이 시장에서 응징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통한 해결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형연기금이 주택업체의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연금수령자 등 ‘개미 투자자’도 구제의 대상이 된 점은 부인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트렌드뉴스
-
1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2
담배 피우며 배추 절이다 침까지….분노 부른 中공장 결국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5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6
10㎏ 뺀 빠니보틀 “위고비 끊자 다시 살찌는 중”…과학적 근거는? [건강팩트체크]
-
7
[단독]차 범퍼에 낀 강아지, 학대? 사고?…사건의 진실은
-
8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9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10
오디션 출신 26세 가수 자다가 독사에 물려…해독제 못구해 숨져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6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9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트렌드뉴스
-
1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2
담배 피우며 배추 절이다 침까지….분노 부른 中공장 결국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5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6
10㎏ 뺀 빠니보틀 “위고비 끊자 다시 살찌는 중”…과학적 근거는? [건강팩트체크]
-
7
[단독]차 범퍼에 낀 강아지, 학대? 사고?…사건의 진실은
-
8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9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10
오디션 출신 26세 가수 자다가 독사에 물려…해독제 못구해 숨져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6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9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