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용산 개발해 코레일 빚 해결” 2006년 시작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 누가 어떤 결정 내렸나
용산 개발사업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고비 때마다 주요 결정을 내린 사업 최고 책임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용산 개발사업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로 불어난 코레일의 빚 4조5000억 원을 “부동산 개발로 해결하자”고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 철도정비창 터 44만 m²를 팔아 빚을 갚고 민간 사업자가 초고층 빌딩, 쇼핑몰, 호텔, 백화점을 개발해 이익을 갖는 방식이었다.
그해 12월 이철 당시 코레일 사장은 땅을 매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지분 25%를 소유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 전망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2009년 드림허브가 토지대금을 내지 못한 상황에 처한 데 이어 2010년 사업주간사회사였던 삼성물산은 자금조달 문제로 코레일과 갈등을 겪다가 사업에서 손을 뗐다.
당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10년 3차례에 걸쳐 사업협약을 변경했다. 코레일이 4조 원이 넘는 랜드마크 빌딩을 우선 매입하고 토지대금 2조3000억 원의 납부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코레일의 자금 부담을 지나치게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 전 사장은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됐다면 오히려 코레일이 최대 수혜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창영 사장이 부임하며 코레일은 기존 사업의 틀을 깨고 ‘단계적 개발’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정 사장은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최초 계획에 현실성이 있다는 사람이 없다. 이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모든 책임을 코레일이 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출자사 측은 “정 사장이 주주들이 합의해놓은 자금조달, 사업방식에 모두 제동을 걸며 결국 사업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비난했다.
트렌드뉴스
-
1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2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3
추미애 “공소청법, 제왕적 검찰총장 못 막아”…정부안에 반발
-
4
관절 연골 안써야 안닳는다? 되레 움직여야 회복돼[노화설계]
-
5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건강팩트체크]
-
6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7
체중 감량의 핵심은 ‘신진대사’…칼로리 소모 높이는 5가지 방법[바디플랜]
-
8
변시 5번 떨어진 ‘오탈자’ 2000명 시대 [횡설수설/장택동]
-
9
공부도, 당구도 1등…‘당구계 엄친딸’ 허채원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
-
10
[단독]“두건 쓴 무장경비대 길목마다 검문…택시로 20시간 달려 탈출”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5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6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7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8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9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10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트렌드뉴스
-
1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2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3
추미애 “공소청법, 제왕적 검찰총장 못 막아”…정부안에 반발
-
4
관절 연골 안써야 안닳는다? 되레 움직여야 회복돼[노화설계]
-
5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건강팩트체크]
-
6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7
체중 감량의 핵심은 ‘신진대사’…칼로리 소모 높이는 5가지 방법[바디플랜]
-
8
변시 5번 떨어진 ‘오탈자’ 2000명 시대 [횡설수설/장택동]
-
9
공부도, 당구도 1등…‘당구계 엄친딸’ 허채원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
-
10
[단독]“두건 쓴 무장경비대 길목마다 검문…택시로 20시간 달려 탈출”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5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6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7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8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9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10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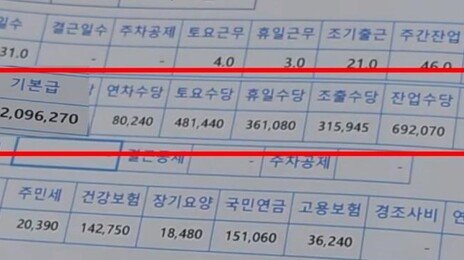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