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어둠속 잔광의 절박함은 어디로 사라졌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1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오치균 ‘뉴욕 1987∼2016’전


4월 10일까지 서울 종로구 금호미술관에서 열리는 화가 오치균 씨(60)의 개인전 ‘뉴욕 1987∼2016’을 각각 혼자 관람한 미술 전공자 두 사람과 차례로 대화를 나눴다. 호오(好惡)는 크게 갈렸지만 기자를 포함해 세 명 모두 한 가지에는 동의했다. 3층에 걸린 1980년대 그림의 칠흑 같은 빛깔이 1, 2층과 지하의 1990년대 이후 대낮 풍경화보다 밝아 보인다는 것.
오 씨는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며 대도시에 홀로 나와 살아가는 처지로 인해 발생한 뒤얽힌 감정을 두툼한 질감의 아크릴화에 담아냈다.
안온한 노을빛에 휘감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진한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한낮 양달의 센트럴파크.
누구도 작가에게 작품을 위해 고단하게 살아가라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작가의 삶에 대해 관람객이 인지한 사전 정보는 어쩌면, 작품의 감흥과 아무 관계없을지도 모른다. 붓 끝을 통해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밀어냈는가. 그 판별은 별로 어렵지 않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5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6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7
10분의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노후 건강[여주엽의 운동처방]
-
8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9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10
“절대 입에 안 댄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3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4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5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6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7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5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6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7
10분의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노후 건강[여주엽의 운동처방]
-
8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9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10
“절대 입에 안 댄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3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4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5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6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7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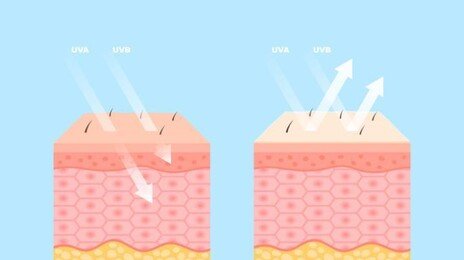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