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연 리뷰]佛 작곡가 사티의 음악에 취해 소박한 맛집 찾은 듯한 반가움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음악극 ‘에릭 사티’ ★★★

연극적 과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막이 열리고 10분 정도 지날 때까지 ‘잘못 들어와 앉았구나’ 싶었다. 그런데 던져지는 이야기를 한 입 두 입 넘길수록 뒷맛이 부담 없이 야릇하다. 1시간 40분 뒤 입안에 남은 것은 뜻밖의 소박한 맛집을 찾아낸 청량감이었다.
시작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젊은 영화감독 지망생이 학교 선배로 보이는 제작자를 붙들고 투덜거린다. “할리우드 판박이는 누구나 찍어요. 시대의 현실을 담아내 세상을 직시하게 만들고 싶어요.” 후우. 또 관객에게 투정부리는 이야기인가.
그때 중산모에 턱시도를 걸치고 긴 우산을 든 에릭 사티가 살짝 찰리 채플린을 흉내 내며 등장한다. 2013년 서울 시공간 한끝이 문득 1917년 프랑스 파리 거리로 구부러져 들어간다.
버팀목은 음악이다. 신경미 음악감독은 ‘짐노페디 1번’ ‘나는 당신을 원해(Je Te Veux)’ 등 사티의 곡을 겉멋 없이 깔끔하게 편곡해 배경에 펼쳤다. 귀에 전해지는 건 소박한 팬의 심정이다. 이야기와 음악 모두, 사티와 그의 음악에 대한 애끓는 연모를 감추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행여 어설픈 공상으로 그의 자취에 누를 끼칠까 내내 조심한다.
“우리 사티 오빠는 ‘파라드’를 작곡할 때 아마 이랬을 거야.” 팬클럽 소녀들의 달뜬 재잘거림을 엿듣는 기분이다.
후반부 ‘파라드’ 공연 재현 장면은 사티가 실존했던 1917년 파리의 한 극장을 이데아로 상정하고 우직하게 모방한다. 기자처럼 ‘짐노페디’만 겨우 아는 문외한이 아닌 사티 음악에 조예가 깊은 관객이라면 불쾌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피카소의 입을 빌려 ‘연극적 약속’을 상기시켜 방어막을 친 건 그 때문이려나.
김민정 작, 정민선 작곡, 박혜선 연출, 박호산 김태한 배해선 한성식 출연. 12월1일까지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3만∼7만원. 02-333-3626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트렌드뉴스
-
1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2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3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4
[단독]‘이적설’ 김민재 前소속 연세대 “FIFA, 기여금 수령준비 요청”
-
5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6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7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8
美 “韓 국회 승인전까진 무역합의 없다”… 핵잠 협정까지 불똥 우려
-
9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10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5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6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7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8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9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10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트렌드뉴스
-
1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2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3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4
[단독]‘이적설’ 김민재 前소속 연세대 “FIFA, 기여금 수령준비 요청”
-
5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6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7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8
美 “韓 국회 승인전까진 무역합의 없다”… 핵잠 협정까지 불똥 우려
-
9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10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5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6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7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8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9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10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공연 리뷰]한국 여배우들의 노래와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이제야 실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11/28/59189058.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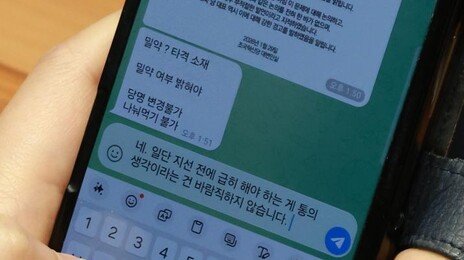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