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여름인데… 오싹하게 좀 해줘’… 4가지 특징으로 정리한 공포소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9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출판사 북스피어의 장르문학소식지 ‘르 지라시’ 최근호는 ‘여름이니까 약간 무서워도 괜찮아’ 특집에서 공포를 4가지 종류로 나누고 대표 작가와 작품을 소개했다. 공포문학 전문가인 박현정 전 드라마티크 편집장, 임지희 전 브뤼트 기자, 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임지호 엘릭시르 편집장, 김봉석 대중문화 평론가가 분석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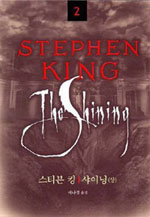
○ 자아성찰적 공포, “난 내가 무섭다”
미국 작가 스티븐 킹의 ‘샤이닝’에서 ‘오버룩 호텔’에 묵던 잭 토렌스는 조금씩 미쳐 가다가 아내와 자식을 죽인다. 여기서 두려운 존재는 오버룩 호텔인가, 토렌스의 내면인가. ‘샤이닝’에서 공포의 대상은 초자연적 존재나 인간의 일시적 광기가 아니다. 성공의 절정에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인간의 사악한 본능이다. 모든 공포의 시작과 끝은 내 안에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오버룩 호텔’로 변하고 내가 토렌스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인생에 한번쯤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고 경고한다.
○ 피 칠갑 공포, “살인 잔치서 유머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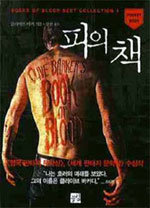
친구를 죽이러 가는 길. 무거운 도끼를 들었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나를 괴롭힌 친구의 사지를 도끼로 찍어 내리며 야릇한 해방감을 만끽한다. 영국 작가 클라이브 바커의 ‘피의 책’에 수록된 단편 ‘드레드’의 한 장면이다. 피가 튀고 사지가 잘리며 내장이 튀어나오는 하드 고어적 묘사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하지만 극도의 기피와 혐오는 관심 그리고 앎과 맞닿아 있다. 비위 상하고 무섭지만 애써 외면하는 고어 장면에 다시 눈이 간다. 꾹 참고 읽다 보면 인생에 대한 신랄한 유머에 웃음이 터질지도 모른다.
○ 따뜻한 공포, “귀신이 날 사랑한다고?”

일본 에도시대. 담배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 오린은 늦은 밤 참배 길을 오갈 때마다 따라오는 ‘배웅하는 등롱(燈籠)’이 무서워 견딜 수 없다. 그런 오린에게 동료가 말한다. “등롱이 너를 좋아하는 건지도 몰라.” 이후 등롱은 무서운 존재에서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변한다. 일본 소설가 미야베 미유키의 ‘흑백’은 괴담인데 따뜻하다. 귀신은 분명히 있지만, 그 존재에 생명을 주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렇기에 오싹하지만 따뜻한 것이다.
○ 진득한 공포, “버림받았다. 그래서 두렵다”

일본의 시골 마을에 ‘시귀(屍鬼)’가 나타난다. 한번 죽었던 이가 의식을 그대로 가진 채 다시 태어나 생존을 위해 인간을 잡아먹는다. 마을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한 남자는 시귀가 되기로 결심한다. 자신을 학대한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다. 일본 소설가 오노 휴우미의 ‘시귀’는 이 소외된 존재를 통해 사회를 바라본다. 진짜 공포는 시귀 자체일까, 아니면 부정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일까. 공포는 바로 현실의 우리 곁에 진득이 도사리고 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3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6
“절대 입에 안 댄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7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8
“갤S26 화면보호 기술 5년 걸려… 복제 쉽지 않을 것”
-
9
트럼프 “이란 함정 9척 격침…해군 사령부도 거의 파괴”
-
10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5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6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7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3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6
“절대 입에 안 댄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7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8
“갤S26 화면보호 기술 5년 걸려… 복제 쉽지 않을 것”
-
9
트럼프 “이란 함정 9척 격침…해군 사령부도 거의 파괴”
-
10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5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6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7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