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연]데뷔 10주년 공연 ‘소리꾼’ 김용우
-
입력 2006년 6월 14일 03시 08분
글자크기 설정


풀빛 청음(淸音)이 느껴지는 미성의 소리꾼 김용우(40) 씨. 인터뷰를 위해 만난 그는 하늘하늘 속이 비치는 태국풍의 옷을 입고 있었다. 전통 민요를 재즈나 아카펠라, 뉴에이지 스타일로 부르는 파격을 시도하고, 차림새나 헤어스타일도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에게 무척 어울리는 옷이었다. 3700여 명의 팬클럽 회원에, 공연장마다 ‘오빠부대’를 몰고 다니는 그는 전통음악계에선 보기 드문 ‘스타 소리꾼’이다.
○ 민요 채집하다 소리꾼으로
1996년 1집 앨범 ‘지게소리’를 내놓은 그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김 씨에겐 여전히 ‘젊은 소리꾼’이란 호칭이 따라다닌다. 고루한 원숙미를 미덕으로 삼는 전통소리 분야에서 그의 시도는 워낙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국악고와 서울대에서 피리를 전공한 그가 민요에 눈을 뜬 것은 1987년.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활동을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르는 농요의 질박한 맛에 흠뻑 빠져버렸다. 그는 이후 카세트 하나를 들고 전국을 떠돌며 8년간 민요 채집에 나섰다.
“소리 공부하러 온 청년을 동구 밖까지 마중 나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막내 손자 노릇하면서 며칠씩 소리를 배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르신들이 항상 고봉으로 떠 주시던 밥을 먹는 일이었어요. 밤새도록 어르신들과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지낸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전통민요와 월드뮤직 사이
“제 첫 앨범에 실린 ‘지게소리’는 충남 태안군의 고성규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노래였어요. 이 곡의 반음 표현을 나름대로 해석해 불렀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아, 이놈아 내 노래를 왜 이렇게 망쳐 놓았어’ 하면서 혼을 내셨지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30일 오후 7시 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원에서 열리는 그의 10주년 기념공연 ‘십년지기’에는 아카펠라 그룹 ‘더 솔리스트’, 풍물굿패 ‘몰개’, 이꽃별(해금) 등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1집 ‘지게소리’부터 지난해 발매한 5집 ‘어이 얼어자리’까지 히트곡과 피아노로 반주한 제주민요 ‘너영 나영’, 레게 리듬이 가미된 ‘신아외기소리’ 등 신곡을 부를 예정이다.
“퓨전 국악을 한다고 국적 불명의 음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월드뮤직’이란 영어로 노래하거나, 서양 음계적 화성을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음악에 튼튼히 뿌리박은 상태에서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죠.”
2만∼4만 원. 1588-7890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공연 >
-

오늘의 운세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사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7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7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공연]여성관객 눈물샘 자극하는 낯익은 이야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0/05/04/2807292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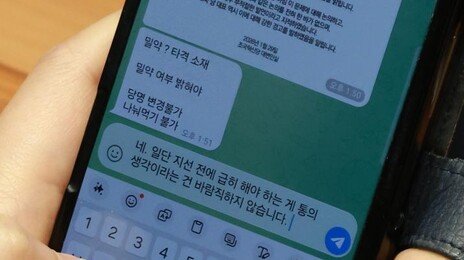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