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화칼럼/송현옥]연극, 더는 외로워지기 싫다
-
입력 2006년 1월 4일 03시 09분
글자크기 설정
이러한 명칭에 어울릴 만한 영화들이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대변하면서 이른바 ‘한류(韓流) 열풍’을 이끌고 있다. 100만 관객 돌파, 용사마 열풍, 효자상품 등의 수식어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면서 우리 영화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연극인들은 썰렁한 소극장 객석에 앉아 ‘떠나간 관객의 귀환’만을 바라며 힘없는 목소리로 ‘연극이야말로 진정한 기초예술’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요즘이다.
대형 뮤지컬이 경이적인 흥행 성적을 올리는 한편 연극을 영화화한 ‘살인의 추억’이나 ‘웰컴 투 동막골’이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는 시점에서 우리 연극은 어떠한 모습으로 연명(延命)하고 있을까?
흔히 연극은 수제품이고 영화는 기성품이라는 비유를 한다. 어차피 대량복제가 불가능한 연극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을 존립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극은 이제 그 비(非)경제성으로 인해 가난의 차원을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예술의 정신보다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더 열을 올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극계도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것은 연극의 대형화, 상업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연예술에서조차 이제 대형화되고 상업화되지 않은 단체는 도태되고 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구멍가게가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진 꼴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허브이자 문화특구라고 불리는 대학로에서조차 정통 연극이 공연되는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
대학로에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거리는 온통 카페와 먹을거리 장터가 되어 흥청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극장이 들어선 건물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고, 비싼 대관료를 내지 못하는 연극 대신 개그콘서트가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변방으로 내몰리는 소극장 연극은 한층 더 소외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연극계도 생존의 자구책으로 경제 마인드를 도입하여,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중 본격적인 기획 공연을 시도하는 코믹액션극인 ‘점프’나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 등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는 문화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문화가 상품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모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예술의 본령은 시류를 초월해서 사물이나 현상의 이면을 보여 주고, 그를 통해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의 힘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 덕분에 문명의 발전이 가능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 그렇기에 예술의 세계에서는 대중의 입맛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고독한 길을 홀로 걷는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품화를 시도하는 문화예술은 어느새 본래의 예술 정신을 잃게 되고 말 위험에 스스로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연극이 기초예술이라고 해서 단지 영화배우나 영화의 소재를 제공하는 초석의 임무만으로 역할을 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연극을 더는 생존을 위한 변신의 길로 내몰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
연극인 스스로 관객의 시선을 잡아 둘 만한 소재 발굴에 적극 나서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해 벽두에 정부도 진정 지원의 손길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되돌아볼 것을 권한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연극 비평
문화 칼럼 >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현장속으로
구독
트렌드뉴스
-
1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2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6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7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8
전원주 4200% 대박? 2만원에 산 SK하이닉스 90만원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5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6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7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10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트렌드뉴스
-
1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2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6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7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8
전원주 4200% 대박? 2만원에 산 SK하이닉스 90만원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5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6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7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10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문화칼럼/신수정]‘왕의 남자’ 또다른 광대 이준익 감독](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6/01/19/696260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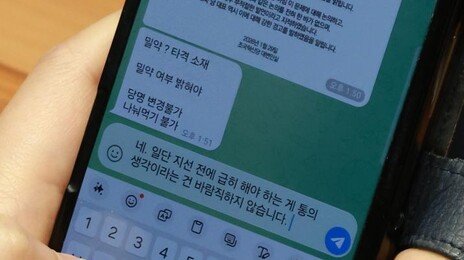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