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책갈피 속의 오늘]링에서 지다…1982년 복서 김득구 사망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45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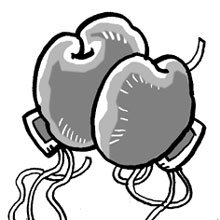
1982년 11월 18일 오전 7시. 비운의 복서 김득구(당시 23세)의 생명을 지탱하던 산소호흡기가 치워졌다. 레이 맨시니와 사투 끝에 링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지 99시간 만이었다.
“내가 살아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자신의 시신이 담길 관을 짜놓고 링에 선 도전자.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아야 했던 챔피언. 그들은 공이 울리자마자 폭풍처럼 맞붙었고 피 튀기는 난타전 속에서 상대방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를 넘봐야 했다.
김은 스트레이트가 주무기였으나 외곽으로 돌지 않고 챔피언과 중앙에서 맞붙었다. 경기는 처음부터 치명적이었다.
김은 당초 전적에서 열세가 확연했다. 24승1패의 맨시니는 떠오르는 ‘백인 복싱 영웅’이었고 16승1무1패의 김은 동양의 무명일 뿐이었다. 현지의 도박사들은 8 대 2로 맨시니의 우세를 점쳤다.
그러나 막상 공이 울리자 김은 무섭게 맨시니를 몰아쳤고 그의 불같은 투혼에 장내는 한순간 숙연해졌다. 초반 한때 맨시니는 그로기까지 몰렸으나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김의 스텝은 차츰 무뎌져 갔다. 그리고 운명의 14라운드. 김은 맨시니의 오른쪽 스트레이트를 맞고 넘어졌다. 그는 로프를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으나 카운트아웃이 선언된 뒤였다. 그는 맥이 풀린 듯 다시 바닥에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잃었다.
피에 굶주린 미국의 관중에게도 이 경기는 충격이었다. 뉴욕 타임스는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프로권투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며 복싱 경기의 잔혹성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김의 죽음으로 사양길을 걷던 국내 프로복싱은 급속히 침체 국면을 맞게 된다. 그것은 70년대, 그 궁핍한 시대의 영웅 ‘헝그리 복서’가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때마침 출범한 프로야구가 팬들의 열광 속에 화려한 팡파르를 울리고 있었으니 이렇게 해서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가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기우기자 keywoo@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K-TECH 글로벌 리더스
구독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

현장속으로
구독
트렌드뉴스
-
1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5
국힘 의총서 설전-삿대질…장동혁 “韓 징계 수사 결과 책임질것”
-
6
[단독]‘국보’로 거듭난 日 배우 구로카와 소야…“올해 한국 작품 출연”
-
7
영덕 풍력발전기 갑자기 쓰러져 도로 덮쳐…인명 피해 없어
-
8
남창희, 라디오로 결혼 발표…“잘 만나오던 그분과 결실”
-
9
김민석 “과정 민주적이어야”…‘정청래식 합당’에 사실상 반대
-
10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트렌드뉴스
-
1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5
국힘 의총서 설전-삿대질…장동혁 “韓 징계 수사 결과 책임질것”
-
6
[단독]‘국보’로 거듭난 日 배우 구로카와 소야…“올해 한국 작품 출연”
-
7
영덕 풍력발전기 갑자기 쓰러져 도로 덮쳐…인명 피해 없어
-
8
남창희, 라디오로 결혼 발표…“잘 만나오던 그분과 결실”
-
9
김민석 “과정 민주적이어야”…‘정청래식 합당’에 사실상 반대
-
10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