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민파업위원회’가 발족됐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을 기해 국민 총파업을 벌이는 것이 목적이다. ‘공약 파기와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공안 탄압’ 등이 파업의 명분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농민, 빈민, 중소상인, 청년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로 파업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과 ‘전국’의 수식어를 동원한다고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민파업위원회는 민노총이 기반이 되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국민파업위원회는 작명에 이미 억지가 내재되어 있다. 국민파업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25대 요구안’을 보면 이런 의제들이 국민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요구들이 포함돼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중단,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 연합 전쟁연습 중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전면 재협상’ 등이 그 사례다. 그리고 국민파업 디데이를 박근혜 정부 1주년에 작위적으로 맞춘 것도 아마추어적이다. 국민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파업위원회가 ‘정치 공세’를 위해 조직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파업위원회는 민노총의 외피(外皮)이다.
국민파업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파업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법을 우회하기 위한 사실상의 한 방편이다. 민노총 대리인으로서의 국민파업위원회가 이끄는 파업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파업위원회가 밝힌 파업 명분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가에 달려 있다.
먼저 ‘민주주의 파괴, 공안 탄압’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그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공안 탄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부를 모독하는 것이다. ‘민생 파탄’도 과장이 아닐 수 없다. 국가 부도 사태를 겪는 것도 아닌데 이를 지렛대로 국민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생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정권퇴진’ 구호는 공감을 얻지 못한다. ‘공약 파기’도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인기에 영합한 대선공약은 고해성사와 더불어 적의 조정되는 것이 맞다. 당선된 후보에게 ‘공약을 잊어라’는 조언이 금언(金言)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파업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수단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의해 추동된 국민파업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명분이 없는 정치파업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부의 기반’을 파괴한다. 투쟁으로 누군가의 이익을 확보했다는 것은 조직되지 않은 다른 누군가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노총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 게리 스탠리 베커 교수가 은유한 ‘승자의 저주’를 깊이 곱씹을 필요가 있다. 승자는 자기 발등을 찍기 쉽다. 조합원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한 민노총의 파업 강행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충수에 지나지 않는다.
기고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기홍 칼럼
구독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한전, 요금 인상 후 3분기째 흑자지만…누적 42.3조 적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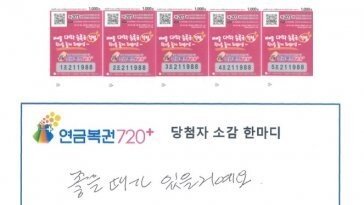
2등 당첨된 줄 알았는데 1,2등 동시에… “배우자 임신한 꿈꿨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끄러워”…주택가 배달원 쇠파이프 폭행한 주민 구속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딜레마 풀자[기고/김덕호]](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5/09/124870288.2.jpg)
![MZ세대가 공무원 지원 접는 5가지 이유[기고/김선태]](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5/08/123703810.15.jpg)
![데이터센터 건설, 전력 안정성과 국익 우선해야[기고/전영상]](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5/07/124823361.6.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