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에 영하 10도 훨씬 아래로 수은주를 대차게 끌어내린 초절정의 강추위가 계속되고서야 비로소 내겐 그 춥고 긴, 그렇긴 해도 정겹기만 한 어린 시절의 엄동설한이 생각났다.
외갓집 사랑채에서 잠결에 들리던 삭풍에 문풍지 떠는 소리, 우리 집 쪽마루의 미닫이 유리창을 아침이면 언제나 하얗게 도배하던 기이하고도 다양한 패턴의 성에, ‘메밀묵 찹쌀떡….’
꿈속인지조차 가늠되지 않게 멀리서 들려오던 어느 고학생 떡장수의 애수 어린 단조의 공허한 외침, 창백한 눈썹 달 아래 침침한 골목을 구슬피도 파고들던 ‘맹인’―당시는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불렀다―안마사의 가녀린 피리 소리, 그러다가 낮게, 아주 낮게 겨울의 까만 밤 아래로 근엄하게 내려앉던 자정의 통금 사이렌 소리….》
● 청평호반 ‘쁘띠프랑스’의 낭만을 찾아
그 겨울밤에 이런 소리만 들린 건 아니다. 뜨끈뜨끈한 안방 아랫목을 차지한 두툼한 이부자리에서는 빡빡하게 쑨 밀가루 풀을 정성들여 매겨 가슬가슬하다 못해 깔깔했던 솜이불 하얀 홑청이 몸부림에 부서지며 내는 파삭거림까지 더했다. 그래서 내 어린 시절 긴긴 겨울밤은 추위보다도 오히려 이런 낯익은 소리 덕분에 더욱 생생히 되살아난다.
이런 생각 속에 다섯 손가락을 접었다 펴며 세월을 헤아린다. 하! 벌써 44년.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과 ‘마이카시대’라는 글씨가 큼지막이 표지를 장식한 정부홍보책자가 그 이듬해 겨울 한 움큼 집에 배달됐던 기억으로 미뤄 이건 1968년쯤 겨울의 기억이다. 그간 세월은 무심히 흘러 나도 이제 50대 중반. 당시 사십 고개 턱밑의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장년이 됐다. 서울 아현동(마포구) 고개 비탈의 열여덟 평짜리 길쭉한 쪽마루기와집은 10여 년 전 헐려 그 자리를 다세대주택에 내주고는 내 어린 시절 기억의 전부였던 골목과 함께 사라졌다. 유리창의 성에를 본 지도 이미 까마득하고 찹쌀떡장수 고학생과 두부장수 종소리는 다큐 필름에서나 듣는다.

어렵고 힘들던 그 시절의 겨울밤은 길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밤도 낮처럼 밝고 또 바삐 돌아가는…. 그 옛 겨울과 지금의 이 밤이 같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68년의 겨울밤이 더더욱 애잔히 추억되는 것은 그 때문인데 돌아가신 부모님만큼이나 그립고 아쉽다. 허전하고 황망하다. 그러던 중 엉뚱한 생각에 이르렀다. 그런 겨울밤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청평호반(경기 가평군)이 떠올랐다. 꽁꽁 얼어붙어 찾는 이 없어 침잠과 고요로 점철된 그 호반이라면 길고도 애틋한 1968년의 겨울밤을 되찾을 것만 같았다. 한밤중 호수가 얼면서 꽝꽝거리는 소리도 들릴 것 같고 외풍을 피해 이부자리 파고들던 그 시절 그 겨울도 다시 체험할 것 같았다.

오후 네 시. 짧은 겨울 해는 호반을 둘러싼 가평의 허다한 산 너머로 일찌감치 내려갈 채비를 시작했다. 나는 코끝 시리도록 외풍이 닥치는 소박한 옛 가옥의 민박집 찾기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근방 ‘쁘띠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쓴 소설 ‘어린 왕자’를 테마로 청평호와 호반이 내려다보이는 산기슭 중턱에 조성한 자그만 프랑스 마을이다. 언젠가 해질녘 여길 지나며 이곳이 호반의 노을 감상에 좋으리라 점친 적이 있어 그 기억으로 찾은 것이었는데 오늘은 내쳐 아예 하룻밤을 게서 보낼 작정이었다.
오후 다섯 시. 방문객은 모두 떠나고 쁘띠프랑스는 문을 닫았다. 이제 이 안에 남은 이는 나와 직원 몇 사람뿐. 호반의 마을에선 전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뒤편의 산 너머로는 이해 첫 주말의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더불어 기온도 장갑 낀 손가락의 끝이 시릴 만치 급속히 떨어졌다. 수은주는 이미 영하 16도를 가리켰다. 기온에 따라 노을 빛깔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지는 해는 추울수록 명료하며 노을빛은 빨갛고 강렬하고 선명하고 투명하다. 그래서 더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무릎 높이의 화산 세 개와 장미 한 송이뿐인 소행성 B612에서 온 어린 왕자는 해 질 무렵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해 지는 걸 하루에 마흔세 번이나 보았다고 했다. 몹시 슬플 때는 해 지는 모습이 보고 싶다면서. 하지만 마흔세 번이나 해 지는 걸 구경하던 날, 그렇게도 슬펐냐는 조종사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론 조종사는 알고 있었다. 석양을 바라보면 유쾌한 생각이 들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볼 때 마음으로만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 정말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어린 왕자의 이 말대로 진솔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말이지….
가평=글·사진 조성하 여행전문기자 summer@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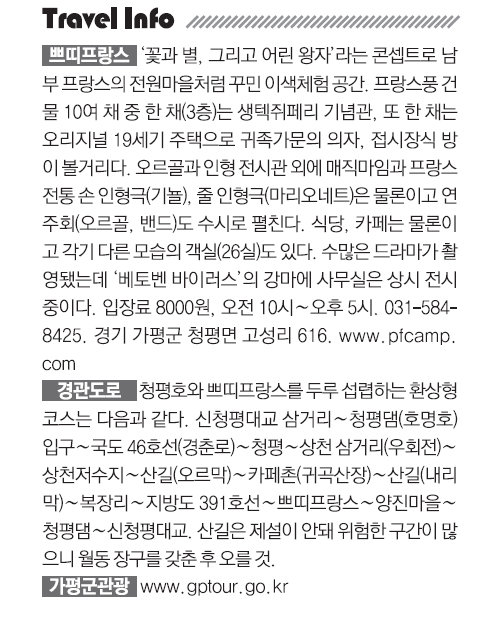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대한민국 나랏돈, 어디로 제일 많이 가나…“2005년부터 ‘보건복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산채비빔밥이 7000원?…” 바가지 없는 지역축제의 ‘훈훈’ 후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년제 대학 올해 등록금 13% 인상…1인당 연평균 3만2500원 올랐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