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O2/뮤직] 김마스타가 본 '지산밸리 2010', 한식 상차림에 서양식 퐁듀가 올라온 느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9일 00시 28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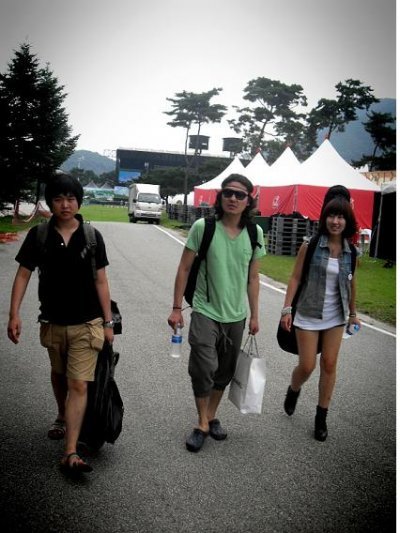
이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한 뮤직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Head Liner)'가 일본 가수인 파타(X JAPAN)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 그 결정에 분노하며 이런 저런 대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헤드라이너란 공연 당일의 간판 출연자를 뜻한다),
만일 주최 측이 몽환적인 음악을 원했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아이러닉휴'의 공연을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그들은 캐나다 록페스티벌에까지 초청 받을 정도였지만 국내 팬이 적다는 이유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굳이 일본의 괴성전문가가 필요했다면 정통 하드록 사운드의 '후카 화이트'를 초청하면 될 일이었다. 혹은 즐거운 록큰롤이 그리웠다면 일본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한 '타마 앤 배가본드'를 모셨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 한국의 록 페스티벌 메인 무대를 장악한 외국산
올해 이천에서 열린 '지산밸리 록페스티벌'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외국인 밴드를 여럿 초청해 무대의 격을 높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8월1일)에는 영국의 록밴드 뮤즈(MUSE)의 폭발적인 라이브가 있었고, 그 전날에는 1980년대의 인기그룹인 '펫샵보이스'가 출연해 축제 관람자들을 기쁘게 했다. 뮤즈의 메인보컬 매튜 밸라미의 혼신을 다한 라이브가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그보다 펫샵보이즈를 만난 팬들의 환호성이 기억에 남는다. 이들은 페스티벌에 참여한 전 연령대를 관통하는 '추억'이라는 코드 하나는 확실하게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조금은 불만족스럽다. 축제 현장에서 2박3일간 숙식을 해결하며 잠을 잤던 젊은이들에게는 음식의 가짓수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는 기어가 있다. 1단에서 4단까지 스틱은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려지는 법이다. 오토매틱 차라고 해도 우리의 손만 빌지 않을 뿐 기계가 대신해서 체인을 고리에 걸어 강약을 조절하는 법이다. 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던 것일까?

■ 강약 조절 없이 소음과 고함만으로 일관하는 록 페스티벌
유일하게 구미가 당겼던 한 여가수의 순서를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했다. 뙤약볕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들었다. 오히려 동네 인근 개울을 지나 만났던 토마토 밭과 수목원의 모습이 더 축제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행사의 마지막 날 노을이 질 쯤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만일 김태화의 '안녕'이라는 노래가 멋들어진 노장 로커의 반주 속에 울려 퍼졌다면 좋겠다고 말이다. 이는 동네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마치 거대한 괴수처럼 치장한 로커들의 분장에 놀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기어만 제대로 올라갔으면 손에는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잠시 귀를 기울였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 공연이 있었다면 후배 음악인들은 "평생을 음악을 위해 몸바치겠다"고 다짐했을 지도 모른다. 한 모금에 4000원씩 하는 컵 맥주 대신 팩 소주라도 가슴팍에서 꺼내며 빨대를 꽂으며 진정 음악축제의 멋과 맛을 재음미하려 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 음악만 충분했다면 덜 익은 꼬치 같은 이상야릇한 행사장 주변 음식들도 맛있게 먹어줄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름철 축제에 꼭 필요했던 열무국수에도 쓰라린 욕 한마디를 잊지 않고 내뱉고 말았다.
정오가 좀 지나서부터 새벽 4~5시까지 온 마을을 때려냈던 저음의 소리는 또 어떠했나? 우리 스스로 "저게 과연 음악인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다. 천편일률적인 사운드와 메시지는 마치 어느 탄광의 붕괴 소리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 비싸기만한 음식들, 주차장이 된 공터 그리고 불편한 환경
어느 구석에선가 공연했던 한 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이 참 좋았다고 누군가 귀띔했다. 그러나 하루에 1km가 넘는 거리를 열댓 번씩 왕복해야 했던 고령의 필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열리는지 확인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박새별'이나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공연이 보다 낭만적이고 예술적이지 않았을까.
입구부터 공항 검색대 같은 삼엄한 게이트를 비롯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준의 괴기한 음식들. 그리고 마치 블루마블 돈같이 생긴 페스티벌 화폐는 순식간에 평가절하되기도 했다. 음악평론가 김작가의 말대로 대중음악계의 허리선에 있는, 그리고 외국 밴드의 이름을 헤드라이너로 이용만 했던 페스티벌에 남긴 어느 관객의 말을 이 자리를 통해 지산밸리 측에게 전달해본다.
"들국화 출신의 조덕환씨의 공연이 가슴 찡하게 다가왔던 것이 이번 '펜타포트'의 거대한 수확이었다고 생각해요."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5
우원식 국회의장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아쉬워”
-
6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소방서에 1시간씩 욕설 전화… “민원 생길라” 응대하다 발 묶여
-
9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10
일하다 쓰러진 60대 남성, 장기기증으로 2명에 새 삶 선물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4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7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8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9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10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5
우원식 국회의장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아쉬워”
-
6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소방서에 1시간씩 욕설 전화… “민원 생길라” 응대하다 발 묶여
-
9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10
일하다 쓰러진 60대 남성, 장기기증으로 2명에 새 삶 선물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4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7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8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9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10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