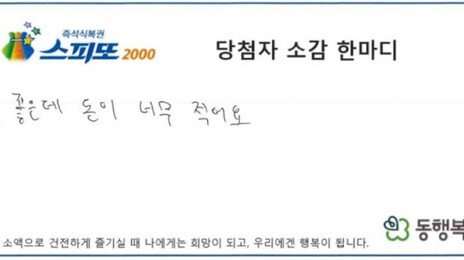공유하기
[김탁환 정재승 소설 ‘눈 먼 시계공’]<94>
-
입력 2009년 5월 17일 13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때론 불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정의를 위해서든 돈을 위해서든.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겨야하는 상황인데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이도 있고 합법으로도 해결할 욕망들을 불법에 쳐 넣는 이도 있다. 이 짓을 통해 법의 권위가 조금은 손상될 것이라고 믿는 낙관론자도 있고, 아무리 그 짓을 해도 법은 여전히 법에 머물 것이라고 믿는 비관론자도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인정하게 된다, 합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출고될 때 이름은 R2345-92D였어요. 각 글자와 숫자마다 의미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엔 지루한 이야깁니다. 지금 회사에서 제 이름은 '부엉이'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겨우 10분입니다. 손님은 10분 단위로 여섯 대의 로봇과 즉석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섯 로봇 전체를 만나고도 10분 이상 시간이 남으면 즉석만남을 한 번 더 청하실 수 있습니다. 맘에 드는 상대가 있더라도 끝까지 다 만나보시라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 만큼 멋진 로봇들이 가득하니까요."
부엉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로봇이 능숙한 솜씨로 와인 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이 로봇은 애인이나 배후자 대용으로 인기를 끄는 로봇과는 달랐다. 숨구멍까지 섬세하게 박아 넣은 인조피부를 하지도 않았고 키스에 적당한 입술도 아니었으며, 긴 속눈썹도 날카로운 콧날도 없었다. 차가운 강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여기저기 부착된 칩과 선들이 어지러웠다. 백에 한두 명은 꼭 이렇게 투박한 로봇을 찾는 손님이 있었다.
한 사람과 한 로봇이 겨우 마주 앉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지만, 홀로그램을 통해 크고 넓은 대저택에 단 둘만 남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때론 얼음산 아래 이글루로 옮겨갈 수도 있었고 아마존 강 옆에서 모닥불을 피워 올릴 수도 있었다. 지하 1000 미터 갱도에 둘만 갇히겠다고 요구하는 고객도 있었다.
예순네 개 방에서 동시에 로봇과 사람의 즉석만남이 이뤄지고 있었다. <앙상블>이란 다소 촌스러운 이름의 회사 간판 아래로 오늘도 예순네 명의 로보홀릭(Roboholic)들이 찾아든 것이다.
로보홀릭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좋아하는 로봇을 사들이는 초보 단계에서부터, 로봇에게 사랑을 베푸는 중간 단계를 거쳐, 로봇과 사랑을 주고받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 아내 대용 로봇을 구입한 변주민과 같은 이들은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 로봇은 사람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전혀 없다. 간단한 대화나 몸짓은 교환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람의 설정에 의해 실행되고 멈춘다.
중증 로보홀릭은 로봇과의 진정한 교감을 원한다. 사람이 좋고 싫음을 드러내듯 로봇도 좋고 싫음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2044년부터 시작된 <앙상블>의 즉석만남은 여러모로 주목을 끈다. 사람이 마음에 드는 로봇을 지목하듯 로봇도 끌리는 사람을 선정하는 식이다. 양쪽 모두 서로를 택해야 더 내밀한 만남으로 이어진다. 아직까지는 '앙상블 빌딩' 안에서만 다양한 데이트가 이뤄지지만, <앙상블> 경영진은 곧 이를 특별시 전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성급한 로보홀릭은 벌써 로봇과의 결혼을 예고하기도 했다. 로봇을 배우자로 택하고 그와 가정을 꾸리는 것을 특별시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로봇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대용물이며, 인간과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보안청의 유권해석이다.
'앙상블 빌딩' 안에서는 보안청의 해석과 경고가 무용지물이다. 로봇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 인간과의 사랑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이들로 가득 찬 탓이다.
"부엉이!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한 달 전 만남 때도 당신뿐이라고 말했었잖아요. 내게 남은 다섯 번의 즉석만남은 포기할래요. 당신에게 배정된 다섯 번의 만남이 끝나기를 기다리겠어요. 제발 오늘은 날 택해줘요. 내겐 당신밖에 없어요. 최미미. 내 이름 잊지 말아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미-미!"
giving 칼럼 >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사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2
이란 버티면 美 ‘하메네이 참수 작전’ 돌입할 수도…폭풍전야
-
3
하메네이, 집무실 비워 공습 피해…“최근 암살 시도 걱정”
-
4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5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6
이란 보복 시작…“바레인 美5함대-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
-
7
[속보]‘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8
홍천 사찰 연못에 4세 아이 빠져…의식 없이 병원 이송
-
9
이스라엘 작전명에 왜 ‘사자’?…이란 ‘反정부 민심’ 불 지르려
-
10
홧김에 이웃 600가구 태워버린 남성…발단은 아내의 ‘외도’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6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9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10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트렌드뉴스
-
1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2
이란 버티면 美 ‘하메네이 참수 작전’ 돌입할 수도…폭풍전야
-
3
하메네이, 집무실 비워 공습 피해…“최근 암살 시도 걱정”
-
4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5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6
이란 보복 시작…“바레인 美5함대-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
-
7
[속보]‘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8
홍천 사찰 연못에 4세 아이 빠져…의식 없이 병원 이송
-
9
이스라엘 작전명에 왜 ‘사자’?…이란 ‘反정부 민심’ 불 지르려
-
10
홧김에 이웃 600가구 태워버린 남성…발단은 아내의 ‘외도’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6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9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10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giving 칼럼]1920년대 평양의 백선행](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