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론/선우석호]새 성장동력 ‘글로벌 인수합병’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실적 美의 6300분의 1 불과
한국 경제의 성장은 초기에 국가가 주도한 면이 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격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먹을거리를 찾아 고단한 생존을 유지해 온 우리 기업의 덕이었다. 기업이 1970, 80년대에는 수출, 1990년대에는 현지화로 승부를 걸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유효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일본이 동남아 현지 생산법인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이즈음 우리 기업도 아시아에 국한된 현지화 전략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선 아시아에 편중된 현지화 전략을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기술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해 세계의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제조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현지화는 초기 자금이 적게 들고 번 돈으로 재투자해 확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 진입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고 현지 시장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인수를 통한 진출은 초기에 큰 자금이 들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 능력을 즉시 확보할 뿐 아니라 이를 인수 기업의 보유 기술력과 융합시켜 목표 고객에게 즉시 유통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이 전략을 타 지역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경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MNC)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은 해외 인수합병(M&A)에 소극적이다. 2006년 실적을 보면 미국의 6300분의 1, 일본의 38분의 1, 중국의 47분의 1 규모이다. 실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실패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인센티브가 경영자에게 없기 때문이다. 해외 M&A를 추진할 능력을 보유한 대기업은 대부분 창업 2세가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민영화된 공기업이다. 실패율이 높은 해외 M&A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지배구조다.
해외 M&A의 실패율은 무려 70∼80%에 이른다. 돈 들인 만큼 알짜 자산이 된 경우가 흔치 않다는 얘기다. 실패 요인을 보면 양사 간 시너지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다든가, 과도한 값을 지급한 것이 큰 원인이지만 인수 후 조직통합과정(PMI)에서 범한 실수가 이유의 50%를 넘는다.
해외 M&A를 성공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국내 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M&A 게임을 안 해 본 사람이 해외에서 성공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최경주나 박세리 선수처럼 국내에서 닦은 기량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국내 M&A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단이 세계 시장 규모에 근거하되 예측 가능해야 한다. 또 투자은행과 대형 사모투자펀드(PEF)의 육성이 필요하다. 기업에 좋은 짝이 될 만한 매물을 중개하고 적정한 가격과 인수 전략을 구사할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매물에 공동 투자할 다양한 형태의 PEF를 육성해야 한다.
국내 M&A 시장부터 활성화를
기업은 국내외 M&A를 주도할 실무진과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에 M&A 전략팀을 구축하고, 사업본부에는 통합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킬 인력을 양성하며, 피인수 기업에 적용할 통합관리 및 재무회계 시스템을 국제 수준에 맞춰 구축해야 한다. 유창한 영어는 기본이다. 새 성장 동력으로서 해외 M&A에 적극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대 교수 한국재무학회 회장
황희연의 스타이야기 >
-

샌디에이고 특별전 맛보기
구독
-

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구독
-

정경아의 퇴직생활백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황희연의 스타이야기]기린을 닮은 여자, 장만옥](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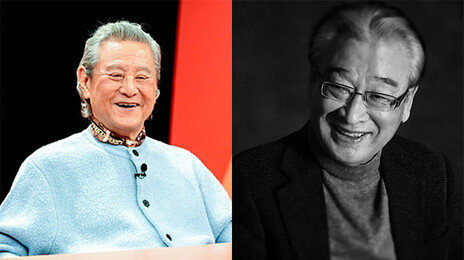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