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과 내일/홍찬식]400년 전의 韓流
-
입력 2007년 1월 23일 19시 25분
글자크기 설정

통신사가 숙소에 당도하면 사절단의 한시와 서예, 그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우리를 만나려는 일념으로 200리, 300리 떨어진 곳에서 식량까지 갖고 여기까지 와서 5, 6개월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그들에게 글을 써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담하겠는가.’ 김인겸의 또 다른 기록이다.
일본 열광시킨 조선통신사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이 사절단 파견을 요청해 오자 조선은 고심 끝에 수락했다. 1607년 1월 한양을 출발한 일행 467명은 5월 24일 에도에 도착해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를 만나 국서를 교환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끌려간 조선인 1418명을 돌려받아 7월 17일 귀국한다. 올해는 조선통신사가 첫발을 뗀 지 400년이 된다.
모두 12차례 파견된 조선통신사는 문화사절단이기도 했다. 전국에서 한시를 잘 짓는 사람을 뽑아 갔다. 그 어려운 한시를 앉은 자리에서 술술 지어 내는 모습에 일본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예가 뛰어난 사람과 저명한 화가들이 참가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와 병을 잘 고치는 의원이 가세했다.
조선이 통신사를 보낸 것은 실리적 선택이었다. 임진왜란은 끝났지만 일본이 다시 침략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일본 정세를 파악하려 했다. 한반도 북쪽에선 훗날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 여진족이 세력을 넓히면서 우리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다. 위아래에 적을 동시에 갖기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오늘날 한류 열풍을 능가하는 일본인들의 열광적 반응은 조선이 전쟁으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조선이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임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문화로써 교화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조선통신사가 마지막으로 파견된 1811년까지 200여 년간 두 나라 사이엔 평화가 유지됐다. 문화를 앞세운 조선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통신사의 실리 추구는 계속됐다. 통신사는 임진왜란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조총을 은밀히 입수하려 했다. 저잣거리에 상품이 넘치는 일본의 물력(物力·경제력)에 놀라 배우려고 했다. 식량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던 고구마를 처음 조선에 들여온 것도 통신사를 통해서였다.
그렇다고 치욕을 잊은 건 아니었다. 1764년 통신사 대표인 조엄은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통분함을 참고 원통함을 삼키며 간다”고 했다. 사절단은 일본의 사치스러운 접대에 흔들리지 않았고 국가의 체면과 예를 중시했다.
올해 일본은 조선통신사 40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은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역사에 대한 반성이 미흡하고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는 일본의 탓이 크다. 그래도 우리가 주인공이었던 통신사를 기념하는 행사에 주객이 뒤바뀐 건 답답하다.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아쉽다.
우리는 先祖만큼 슬기롭게 日대하나
한국이 대륙과 바다 양쪽 세력 사이에 외롭게 놓여 있는 것은 임진왜란 때와 똑같다. 우리가 일본에서 일으킨 한류 열풍은 400년 전을 연상시킨다. 조선통신사가 중단되고 일본이 조선 침략에 다시 나섰듯이 문화 교류는 한일 관계에 중대 변수임이 분명하다.
두 나라 정치인들이 서로 묵은 감정을 헤집으며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쉽게 흥분했다 잊어버리는 감정적 대응이 앞서는 편이다. 현재 민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두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은 조성돼 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한층 복잡해졌다.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선조보다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씨네@메일 >
-

동아시론
구독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샌디에이고 특별전 맛보기
구독
트렌드뉴스
-
1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2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3
사형 구형땐 욕설, 5년 선고땐 잠잠…尹 방청석 확 바뀐 이유는?
-
4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5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8
도쿄 철도 정전으로 9시간 먹통…67만명 아수라장 (영상)
-
9
임이자 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다”…파행 불보듯
-
10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1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
2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3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4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5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6
① 당권교체 따른 복권 ② 무소속 출마 ③ 신당, 韓 선택은…
-
7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
8
국힘 “李, 한가히 오찬쇼 할 때냐…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아와 경청해야”
-
9
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
10
“고장난 승마기가 30만원?”…전현무 기부 바자회 시끌
트렌드뉴스
-
1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2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3
사형 구형땐 욕설, 5년 선고땐 잠잠…尹 방청석 확 바뀐 이유는?
-
4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5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8
도쿄 철도 정전으로 9시간 먹통…67만명 아수라장 (영상)
-
9
임이자 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다”…파행 불보듯
-
10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1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
2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3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4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5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6
① 당권교체 따른 복권 ② 무소속 출마 ③ 신당, 韓 선택은…
-
7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
8
국힘 “李, 한가히 오찬쇼 할 때냐…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아와 경청해야”
-
9
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
10
“고장난 승마기가 30만원?”…전현무 기부 바자회 시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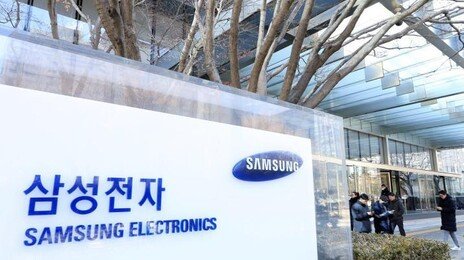

![[사설]‘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175728.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