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아광장/임채청 칼럼]‘同色정치’
-
입력 2004년 12월 7일 18시 21분
글자크기 설정

그해에도 총선이 있었고 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야당과 언론이 함께 반대했지만, 여당은 국회 무술경위 300명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1958년 12월 24일의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다. 4개월 뒤 경향신문의 발행 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1년 뒤 4·19혁명이 일어났다.
▼분란의 끝인가 시작인가▼
역시 그해에도 총선이 있었고 여당이 승리했다. 이번엔 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문제였다. 새벽에 관광버스로 국회의사당에 실려 온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기습 처리했다. 1996년 12월 26일의 이른바 ‘노동법 파문’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 경질이 이어졌지만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끝내 환란(換亂)이 닥쳐 정권도, 민생도 무너졌다.
올해도 총선이 있었고 여당이 오랜만에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또다시 연말 국회에서 볼꼴 사나운 장면이 연출된 게 무슨 조화인 듯싶다. 국보법 논란이 분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 한층 마음이 무겁다. 새해를 맞이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다.
여당도 할 말이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주장처럼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기피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밀어붙인 것은 현명치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1958년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1996년엔 국회의장 공관에서 각각 농성을 하고 있었다. 올해보다 정상 참작 여지가 훨씬 컸지만 법안 변칙처리 후 민심은 결코 여당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게 여당의 책임이고, 과반 의석의 부담인 것이다.
작년 이맘때만 떠올려도 여당의 얼굴이 달아오를 것이다. 당시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금과는 정반대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의 야당 간사가 “위원장이 사회를 못 보겠다면 다수당 간사가 사회를 볼 수밖에 없다”고 다그치자 여당 소속 위원장은 “폭거”라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다. 올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의 여당 의원들 절규도 아직 생생하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초선 의원이어서 어느 국회보다 청신한 기대를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이기에 충격이 크다. 더구나 주문 외듯 개혁을 외쳐 온 여당이 구태(舊態)의 실행자인 데다, 거기에 앞장을 선 이들이 바로 초선 의원들이라 더욱 실망스럽다.
정치권은 묘한 곳이다.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목소리가 달라지고, 권력에 맛을 들이면 눈빛조차 달라지는 이들이 흔하다. 사실 과거에도 대다수 정치인은 초심이야 개혁적이었을 것이나 얼마 가지 않아 정치에 오염돼 변질되고 변색되곤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나없이 유권자를 속이고 결국 누렇게 ‘동색(同色)’이 됐을 것이다. ‘12·6파동’은 17대 국회와 여당의 타락을 예고하고 경계하는 경보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변색된 개혁’은 더 흉하다▼
4·19혁명 직후 시인 김수영은 ‘혁명이란 /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할 터인데 /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라고 읊었다. 여당이 지향하는 게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라면 이 시구의 한 낱말만 바꿔서 음미해 보면 어떨까 싶다. 반(反)개혁적인 수단에 의한 개혁이란 아무리 목적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여당이 법안의 변칙 상정 시도에서 멈춘 것이다. 만약 여당이 한 걸음 나아가 법안의 변칙 처리까지 꾀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당당하지 못한 방법은 개혁의 명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색되고 변질된 개혁은 모습이 더 흉하고 악취가 더 심하다. 여당이 여기서 돌아가는 게 옳다.
임채청 편집국 부국장 cclim@donga.com
동아광장 >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횡설수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韓근로자 구금-불륜’ 놈 美국토장관 경질…트럼프 격노 이유는?
-
2
UAE서 원유 600만 배럴 긴급 도입…호르무즈 우회로 확보
-
3
“맨홀에 끼여 발목 뼈 산산조각” 엄지원, 日 여행중 긴급수술
-
4
美, 이란전쟁에 하루 1조3000억원 쓴다…전투기 뜨면 443억
-
5
‘충주맨’ 김선태, 영상 하나로 이틀만에 100만 구독자
-
6
정청래 “‘대북송금’ 조작 검사들 감방 보내겠다…檢 날강도짓”
-
7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8
상주서 50대 남편, 30대 아내 흉기 살해…아내 지인도 찌른뒤 자해
-
9
방미 文, 이란전쟁에 “무력 사용 억제…평화적 해결해야”
-
10
‘월 400만 원’ 인증한 태국인 노동자…“단 하루도 안쉬었다” [e글e글]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정청래 “‘대북송금’ 조작 검사들 감방 보내겠다…檢 날강도짓”
-
3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4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5
민주 46% 국힘 21%…지지율 격차 더블스코어 이상 벌어졌다
-
6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7
李 “기름값 담합은 중대범죄…악덕기업, 대가 곧 알게될 것”
-
8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9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10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트렌드뉴스
-
1
‘韓근로자 구금-불륜’ 놈 美국토장관 경질…트럼프 격노 이유는?
-
2
UAE서 원유 600만 배럴 긴급 도입…호르무즈 우회로 확보
-
3
“맨홀에 끼여 발목 뼈 산산조각” 엄지원, 日 여행중 긴급수술
-
4
美, 이란전쟁에 하루 1조3000억원 쓴다…전투기 뜨면 443억
-
5
‘충주맨’ 김선태, 영상 하나로 이틀만에 100만 구독자
-
6
정청래 “‘대북송금’ 조작 검사들 감방 보내겠다…檢 날강도짓”
-
7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8
상주서 50대 남편, 30대 아내 흉기 살해…아내 지인도 찌른뒤 자해
-
9
방미 文, 이란전쟁에 “무력 사용 억제…평화적 해결해야”
-
10
‘월 400만 원’ 인증한 태국인 노동자…“단 하루도 안쉬었다” [e글e글]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정청래 “‘대북송금’ 조작 검사들 감방 보내겠다…檢 날강도짓”
-
3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4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5
민주 46% 국힘 21%…지지율 격차 더블스코어 이상 벌어졌다
-
6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7
李 “기름값 담합은 중대범죄…악덕기업, 대가 곧 알게될 것”
-
8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9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10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이정은]그 많던 핵무기 재료는 지금 어디 있을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05/133308751.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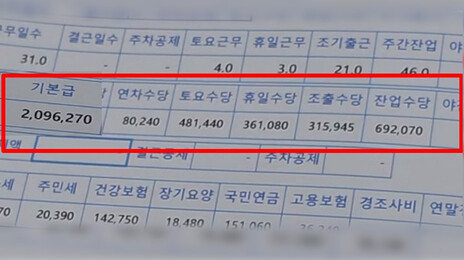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