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봉순이 언니 (70)
-
입력 1998년 7월 14일 19시 28분
글자크기 설정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해가 가기 전, 몇마지기 없는 논을 다 팔아 약값을 댄 봉순이 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부는 죽었다. 두어달 남짓의 결혼생활, 훗날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아마도 언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른다. 가끔씩 들려오는 풍문에 의거한 것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나 의가 좋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남은 것은 빚과 두 아이였다. 전실의 소생인 큰 아이는 큰집에서 맡기로 하고 언니는 아직 돌도 안된 아들 아이를 업고 우리집으로 왔다. 소복 차림의 언니는 방문을 닫고 어머니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른 척하고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심각하고 낮았다. 그리고 창호지 문틈으로 밀려나오던 봉순이 언니의 낮은 흐느낌 소리. 잠시후, 봉순이 언니가 밖으로 나왔다.
―왜 점심이나 먹구 가지. 봉순아.
―괜찮아요. 나오지 말구 그냥 계세요 아줌니
봉순이 언니는 처네를 묶으며 묵묵히 고무신을 신고 헝겊으로 만든 커다란 기저귀 가방을 들었다.
―짱아 잘 있어, 언니 또 올께
머리에는 상중임을 표시하는 흰 핀을 꽂고 토끼처럼 빨간 눈으로 언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순간 내 심장은 후욱, 하고 멎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슬픔에 압도된 것이었을까,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그건 내가 알던 봉순이 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뭐랄까, 짓이겨지고 짓이겨지고 나서도 짓이길 수 없는 오만한 자존심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제 벼랑끝까지 밀려와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달관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뜻밖에도 그 눈빛 속에는 증오와 원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눈빛, 그 눈빛으로 인해 나는 봉순이 언니가 이제 아주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언니는 이제 어떤 강을, 아주 건너가버린 것 같았다. 나는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한발자욱 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봉순이 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 대문을 빠져나갔다. 나는 쭈뼛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문을 나서서 몇발자국 걷던 언니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언니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주머니를 뒤져 내게 십원짜리 동전을 하나 내밀었다.
나는 동전을 받으며 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걸로 사탕 사 먹고… 어여 들어가 언니 혼자 가두 돼
―조기 가겟집까지만 따라갈께… 근데 언니,
―응?
―… 우리집 이사가두 애기 데리구 또 올 거지?
아까부터 불안한 마음에 내가 물었다.
공지영 글·오명희 그림
총선 : 여론조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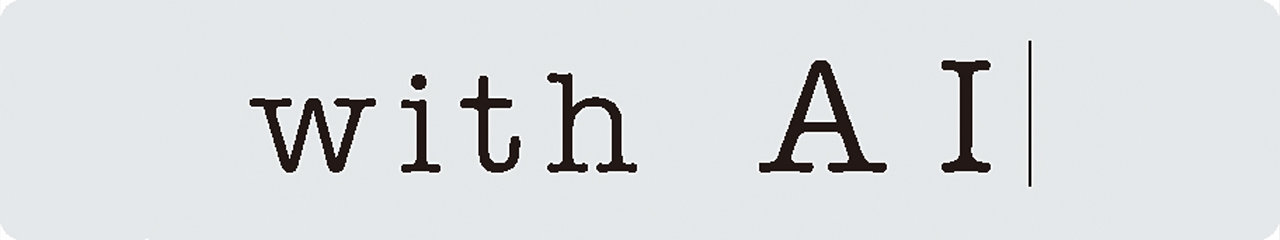
김현지의 with AI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K제조 바꾸는 AI로봇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2
트럼프 “대규모 함대 이란으로 이동 중…베네수 때보다 더 큰 규모”
-
3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4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HBM 왕좌’ 굳힌 SK하이닉스…영업이익 매년 두배로 뛴다
-
7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8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9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10
“전립선비대증, 약 안 듣고 수술 겁나면… 전립선결찰술이 대안”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3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4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
5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6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7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
10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트렌드뉴스
-
1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2
트럼프 “대규모 함대 이란으로 이동 중…베네수 때보다 더 큰 규모”
-
3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4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HBM 왕좌’ 굳힌 SK하이닉스…영업이익 매년 두배로 뛴다
-
7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8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9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10
“전립선비대증, 약 안 듣고 수술 겁나면… 전립선결찰술이 대안”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3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4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
5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6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7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
10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여론조사/내년총선 지지정당]40代이상-한나라 30代-신당](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