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41년 만에 폐지됐던 의경…흉악범죄 계기로 부활하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3일 14시 02분
글자크기 설정
정부, 흉악범죄 막기 위해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
1982년 최초 도입…전경 해체 후 집회·시위도 투입
2017년 文정부 당시 5년간 단계적 감축·폐지 결정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보조 인력인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단계적 폐지가 확정된 의경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5월 의경 마지막 기수(1142기)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련의 범죄나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며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서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으로 4000명 등 대략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의 발언은 의경 폐지로 치안 수요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 채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길거리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력은 4분의 1정도인 3만명 정도”라며 “지구대, 파출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이후 의경은 폐지되기 전까지 41년간 청사 방호, 교통질서 유지, 범죄 예방 활동 등 치안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2013년 전투경찰순경(전경)이 사라진 후에는 집회·시위 대응에도 투입됐다.
한때 만연한 구타 및 가혹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도를 아예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외출·외박 등 군보다 복무 여건이 낫다는 점 때문에 의경은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의경은 소위 ‘사회 유력인사’ 자제들이 편하게 병역을 마칠 수 있는 통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의경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그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0%씩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당시 2만5911명이었던 의경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신 경찰관 7773명을 뽑아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경이었지만, 경찰 안팎에선 ‘폐지 이후 집회·시위 등 현장 대응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하면서 현장 인력은 물론 특공대·장갑차까지 동원됐지만 또다시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 경력 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다고 당장 직업 경찰관을 충원하는 것은 시간이나 예산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 의경 8000여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치안 보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찰은 병역자원 중 일부를 넘겨받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 중으로,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치안 보조 역할을 하는 의경 부활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급박한 현장에서 의경에게 전문적인 활동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8000명 규모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래도 문제가 계속 터지면 그때마다 규모를 더 늘릴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묻지마 범죄 >
구독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6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7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6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7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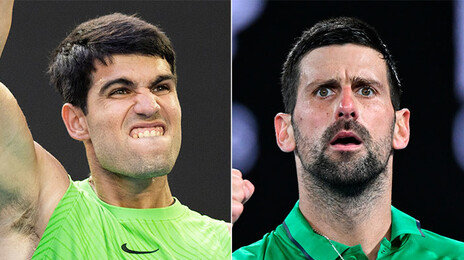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