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영춘 참회록 "나는 지역주의의 노예였습니다"
-
입력 2003년 9월 16일 14시 55분
글자크기 설정

"전라도는 90% 이상이 뭉쳤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앉아서 당하면 또 5년입니다. 우리도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청을 높이는 동료 연사의 연설을 뒤에서 바라보던 김영춘(金榮春)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인물과 정책이 아니라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자신이 앞장서서 막겠다고 지지자들에게 다짐하고 부산으로 향했던 터였기 때문이다.
동원된 청중들은 '옳소' 하며 맞장구를 쳤으나 뒤쪽의 청중들은 냉담했다.
"창피스럽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연단에 오른 나는 동료 의원이 내뱉은 지역감정 자극 발언을 쓸어내리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가 연설을 마쳤어요. 그런데 연설회가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는데 졸업 후 처음만난 고교(부산 동고) 동창생이 다가오더니 '너한테 실망했다. 이렇게 지역감정이나 선동해서야 되겠느냐'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두터운 지역주의 벽앞에 고개숙이고 이를 방조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기억들을 괴로운 표정으로 털어놓았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 흔히 상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꺼내지 못한 채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 밖에 없었어요. 같은 패가 내는 소리에 대해 '난 책임없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으니까…."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김 의원 자신이 그같은 지역감정의 수혜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2000년 총선을 1개월쯤 앞둔 어느날, 그가 지역구(서울 광진갑)의 한 동네 어귀에서 만난 50대 후반의 남자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튀어나온 반응은 "한나라당 후보입니까. 나한테는 부탁할 것 없어요"라는 한마디였다.
놀란 김 의원에게 남자가 혼잣말처럼 내놓은 설명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싫어서 난 무조건 한나라당이다. 전라도 정권에 표 찍는 일 없을테니 걱정말라"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속으로 '내가 어떤 후보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지역감정 때문에 찍겠다는 당신같은 사람 표는 필요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속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당선도 그런 사람들의 맹목적 지역주의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난 3년반 동안 그는 지역감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빚진 죄인같은 심정이었다.
"선거 때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호남출신의 설렁탕집과 한나라당 당원의 설렁탕집은 단골이 확연히 구별돼요. 따뜻한 이웃이어야 할 주민들이 지역주의 정치 때문에 원수처럼 패가 갈려 있는 겁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당 커뮤니티와 한나라당 커뮤니티가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색적이고 배타적으로 대립하는 '악성 지역주의'는 시급히 극복돼야 합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같은 지역주의가 파행과 대결을 부추긴다고 안타까워했다.
"2000년 정기국회에 이어 2001년에도 대정부질문을 10여일간 준비했다가 한나라당의 영남출신 의원과 민주당의 호남출신 의원간에 원색적 비난과 욕설로 본회의가 파행되는 바람에 대정부질문을 못한 적이 있어요. 속이 상해 파행의 불씨가 된 강경발언을 한 영남권의 한 의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의원님 지역구에선 좋아들 하느냐'고요. 그 의원의 거침없는 답변은 '대부분 좋아한다. 잘했다고, 속이 시원하다고들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김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부겸(金富謙) 의원도 같은 무렵 겪었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는 "영남권 중진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면 지지도가 오르느냐'고 물었더니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지지층을 확연히 묶어두기 위해서도 DJ를 혹독히 비판해야 한다. 대안야당이란 책에나 있는 소리다'라고 충고하더라"고 술회했다.
지역구민과 당 지도부가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나무라기는 커녕 격려하는 풍토에서는 언론이 아무리 '지역주의'를 비판해도 '모기 소리'에 불과하고, 국회에서는 절충과 타협이 실종된 막가파식 정치가 계속된다는 것. 두 김 의원이 지역주의에 굴종했던 지난날을 고백하며 토해낸 우리 정치의 자화상이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0
제주서 유기된 동물 절반은 안락사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5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0
제주서 유기된 동물 절반은 안락사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5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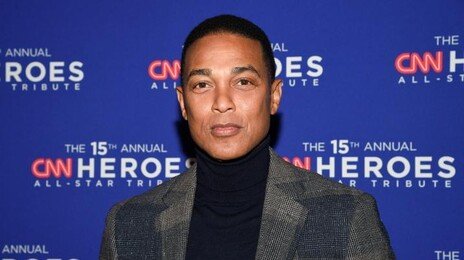

댓글 0